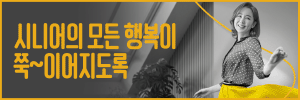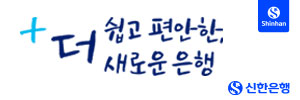수년 전부터 제약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M&A가 비일비재했다. 경영권을 두고 부자간, 형제간 인정사정없이 다투었던 동아제약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272억 원을 기록한 대웅제약도 한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회자되기도 했다.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외에도 이번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경우처럼 회사 간, 내·외부 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숨어 있는 곳도 있다. 제약업계 일부에서 그 중 하나로 광동제약을 지목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의 지분은 6.59%다. 가산문화재단(5.00%), 광동생활건강(3.05%)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81%다. 그러나 광동제약 1대주주는 10.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델리티펀드다. 피델리티와 다른 주주들이 연합한다면 최 대표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광동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피델리티펀드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동국제약 8.83%, 대원제약 9.99%, 환인제약 10.00%, 제일약품 10.00%, 일동제약 10.00% 등 다수 제약업체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투자이익을 얻고 있다. 피델리티펀드의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참여보다 단순투자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투자 이익에 유리하지 않다면 언제든 오너 일가의 뜻과 반대편에 설 수 있다. 일동제약이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노렸지만 피델리티가 녹십자와 함께 이를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이슈를 부각시킨 이 사건은 피델리티의 보유 지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동아제약 지분을 꾸준히 매입했던 한미약품도 동아제약 경영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동아제약이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이 지분을 늘리고 한미약품이 지난해 10월 동아에스티 지분 일부를 매도하면서 양쪽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사그라졌다.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행보도 주목하고 있다. 비록 10%도 안 되는 지분이지만 한올바이오파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8.5%에 불과해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다는 평가다.
중소 제약업체들 사정은 더 복잡하다. 경영권이 취약한 중소 제약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인수되기 십상이다. 지난해 4월 유한양행은 영양수액 전문업체 엠지를 인수했으며, 5월에는 젬백스가 삼성제약의 경영권을 가져왔다. 2013년 근화제약을 인수한 글로벌 제약업체 알보젠은 지난해 8월 근화제약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이던 드림파마를 인수했다. 지난해 중소 제약업체들의 크고 작은 M&A가 잦았다. 물론 이들이 적대적 M&A를 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소 제약업체들의 경영권이 그다지 탄탄하지 못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상장 중소 제약업체 중에는 심지어 개인투자자에 경영권을 위협받은 곳도 있다. 지난 2007년 현대약품은 ‘슈퍼개미’로 불린 박 아무개 씨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박 씨는 ‘경영권 획득’을 이유로 현대약품 지분을 20%가량 매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계 투자회사 데칸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도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9%가 넘는 지분을 매입, 현대약품 최대주주 측과 박 씨, 미국계 펀드의 삼자간 경영권·M&A 분쟁이 야기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삼천당제약이 역시 박 씨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슈넬제약(현 슈넬생명과학)은 지난 2008~2009년 무려 2년 동안이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게다가 분쟁 당사자도 수시로 바뀌면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국슈넬제약은 몇 차례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이처럼 제약업체에서 경영권 분쟁과 M&A가 잦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영권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이 취약하면 비단 제약업계뿐 아니라 SK 같은 대기업도 흔들릴 만큼 일반 기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며 “30% 정도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경영권 위협 요소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 이후 2, 3세 경영체제로 내려오면서 제약업계 특유의 유대관계에 틈이 생긴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비록 창업주들끼리 돈독한 사이였다 할지라도 2, 3세로 내려가다 보면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2, 3세로 내려오면서 오너의 지분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창업주의 지분이 형제자매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제약업체 특성상 신약개발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되기도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회사를 단시간에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노리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업계 최강자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녹십자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혈액제제·백신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혈액·백신제제 강자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인수할 경우 일반·전문의약품 시장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신약 개발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유한양행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