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출판사 한빛비즈 홈페이지 캡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인문학 서적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인문학 열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출판사, 인문학자들이 저마다 앞 다투어 인문서적을 출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강연과 TV 프로그램으로 종횡무진 진출하고 있다. 오로지 경제 발전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에 인문학은 새로운 동력으로 다가왔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편과,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현실너머 편으로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인문학 서적들과는 달리 각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신 마치 하나의 기다란 실로 구슬을 꿰어가듯 주제들을 능숙하게 엮어 나간다. 저자가 풀어놓는 A, B, C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새 머릿속에서 막연하기만 했던 개념들이 선명하게 그 윤곽을 드러낸다.
만약 당신이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정작 가진 밑천이 얼마 없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왠지 가물가물한 느낌에 민망한 말실수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었다면, 주저 않고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쉬운 책이라 해서 결코 얕지 않다. 오히려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인문학 서적이라고 무조건 무겁고 어려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가끔은 제대로 된 에피타이저 한 접시가 큼직한 메인 한 접시보다 더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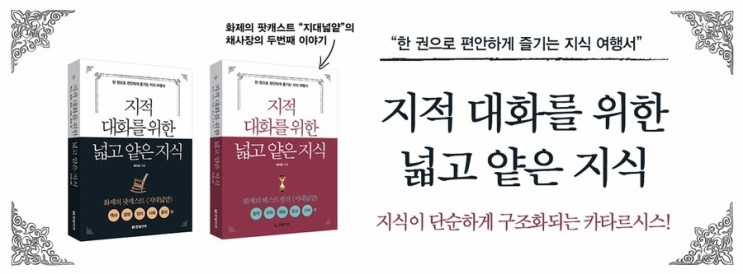
사진=<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출판사 한빛비즈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은 <지대넓얕>의 저자 채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이 책의 성공요인은?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에 대해 전달하고 싶었다. 이 책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세계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독자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가벼운 인문학 서적 열풍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인문학을 일컬어 모든 사람의 학문이고,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가장 일반적, 평균적인 층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어야 한다. 인문학이 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문학을 주로 소비하고 있는 계층은 상위 몇몇 계층에 국한되고 있다. 인문학 자체가 워낙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문학을 접하는 계층 또한 더욱 다양해 져야 한다. 인문학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가벼운 인문학과 깊이 있는 인문학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양쪽 모두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음 서적이나 집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순전히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을 친구나 가족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실용적인 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담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책을 쓸 수 있었다. 오히려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 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아 있다. 다음 기회가 온다면 더욱 많은 분들이 책 내용에 동의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근거가 확실한 책을 쓰고 싶다.”
-저자가 생각하는 대화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 이름이 <지적 대화를 위한…>(지대넓얕)인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읽으면 어디 가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게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것은 대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타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추구한다.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곧 인문학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