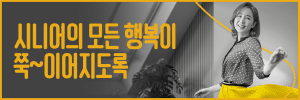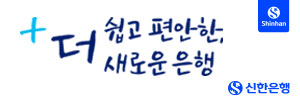올 들어 현대차의 소형트럭 포터2(위 사진)가 국산차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이에 따라 상용차 최초로 연간 1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래 사진은 소형 트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아차의 봉고3트럭.
포터가 세상에 나온 지는 무려 38년이나 됐다. 1977년 HD-10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 뒤 1986년 포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간 포터는 서민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연간 10만 대는 넘지 못했다. 1994년 9만 9521대, 2002년 9만 5829대가 팔린 적이 있다. 이후 2011년 9만 9453대로 다시 판매가 급증했다.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포터의 누적 판매량은 215만 2000여 대에 이른다.
포터2가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소형 트럭은 현대차의 포터2와 기아차의 봉고3트럭이 양분하고 있다. 봉고3트럭의 판매량도 무시할 수 없다. 봉고3트럭은 지난 1~4월 동안 한 달 평균 4500대 정도가 팔려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 1만 2000~1만 3000대 정도의 트럭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터2의 판매량이 느는 이유에 대해 조금은 엉뚱한 해석을 나오기도 한다. 우선 포터2를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서민인지라 경기 불황과 연결 짓는 시각이다. 경기가 나쁘면 퇴직자들이 늘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포터는 주로 길거리에서 채소나 과일을 팔거나 푸드트럭, 이삿짐 운반, 택배 등에 이용된다. 가격이 1500만 원 안팎으로 큰 부담이 없어 포터를 사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이 같은 시각으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면 포터2와 같은 트럭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승용차에 비해 안전성이나 성능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가 ‘호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국내서 충돌 테스트를 담당하는 KNCAP에는 2007년에 테스트된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의 테스트 결과만 기록돼 있다. 5점 만점 기준에 당시의 포터2는 운전석 기준 4점, 봉고3는 3점을 받은 바 있다. 주행 전복 부분에서는 포터2가 3점, 봉고3가 2점을 받았다.
차량 하부에 엔진을 장착하는 포터2와 봉고3트럭의 구조는 승용차 대비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국의 픽업트럭 등은 SUV처럼 전면에 엔진룸을 갖고 있어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전면에 엔진룸이 있는 소형트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구조 변경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가만있어도 경쟁이 없는데 굳이 돈을 들여 설계를 변경할 이유는 없다.
포터 판매 증가를 경기불황이 아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장사를 하면 잘될 것 같아 포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 역시 근거는 부족하다. 트럭의 판매량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안쓰러울 뿐이다.
올해 판매량이 느는 이유로 유로6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있다. 유럽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 도입을 앞두고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 유로6가 적용되면 미세먼지는 현 규제보다 50%, 질소산화물은 80% 이상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차량에 SCR(선택적 촉매 저감장치) 등을 장착할 예정이어서 차량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올해 초 3.5t 이상의 디젤 차량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조금은 억지스럽다. 올해부터는 중량 3.5t 이상의 디젤 차량에 대해서만 유로6가 도입되기 때문. 포터는 내년 6월부터 이 규제가 적용된다.
결국 포터2 판매량 증가의 결정적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는 현실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정수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