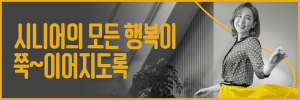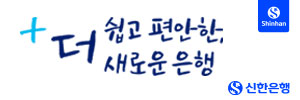멕시칸 패스트푸드점 ‘타코벨’의 본사는 유명 요식업 브랜드를 다량 보유한 미국의 ‘얌(Yum)’이다. 중소기업 M2G는 2009년 국내 판권을 확보해 타코벨 알리기에 힘썼다. 낯설기만 했던 멕시칸 음식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타코벨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2월 M2G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기업 아워홈이 타코벨 사업권을 확보했다며 M2G가 운영하는 매장서 불과 직선거리 1.5㎞ 남짓 떨어진 곳에 신규 점포를 개설한 것.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대적인 홍보에 M2G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M2G 타코벨코리아 함영규 상무는 지난 6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1년의 준비기간과 5년의 영업 등 6년 동안 노력해 타코벨이란 브랜드를 국내에 알려 희망을 갖게 되는 순간 본사 측이 아무런 상의 없이 직속으로 아워홈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함 상무는 “이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그간 적자를 보는 등 M2G의 헌신과 노력 끝에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이 성공 궤도에 접어들게 됐는데 대기업인 본사와 아워홈이 상호 공조 하에 M2G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사와 아워홈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타코벨은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복수 가맹사업자 정책을 펴고 있으며 모두 똑같은 조건 아래 영업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대기업인 아워홈이 타코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2G 측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올 상반기 와인업계는 신세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신세계의 와인사업 확장으로 인해 관련 중소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2008년 수입주류 전문기업 신세계L&B를 설립한 신세계는 ‘와인 대중화’를 내세우며 와인 수입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신세계가 중소업체들이 발굴해 판매권을 확보한 와인에도 눈을 돌리면서 탈이 생겼다. 물량 공세를 이길 수 없는 중소기업은 결국 판매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신동와인은 약 19년 동안 거래한 ‘이기갈’을 빼앗겼고 한독와인의 ‘도멘 메오 까뮈제’ ‘도멘 몽자르 뮈네레’ ‘빌까르 살몽’ 네고시앙코리아의 ‘뿌삐유’ 에노테카코리아 ‘로스바스코스’ 등이 신세계 손으로 넘어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반 막대한 마케팅, 홍보비용을 투자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으면 대기업이 판권을 가져간다. 새로운 와인을 소개하고 인기가 올라가면 또 뺏길까 겁부터 난다”며 “중소업체들이 모여 법적으로 대응도 해보려 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해외 본사 측이 앞서의 사례들처럼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눈앞에서 브랜드를 빼앗기는 것을 보고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2011년 영국의 유명 초콜릿 ‘쏜튼’을 한국에 들여온 라임트리도 대기업과 싸울 힘이 없어 스스로 사업권을 포기해야만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쏜튼’ 알리기에 나선 라임트리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직접 발로 뛰어 판로 개척에 힘썼다. 마케팅 비용에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대체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초콜릿 사업권을 양보해 달라.”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지난해 라임트리는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본사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 대기업 테스코가 쏜튼의 한국 판매권을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라임트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뺏긴 곳이 많다. 힘없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기나. 고민 끝에 사업권을 넘겼지만 대체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없다”며 “답답하지만 다른 사업을 하려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대기업의 횡포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소기업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영국 신발브랜드인 ‘핏플랍’을 독점 수입해 판매해온 중소기업 넥솔브가 주인공이다. 넥솔브는 2009년 영국 본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핏플랍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뒤 각고의 노력 끝에 연매출 200억 원대로 성장시켰다.
판매 확대를 위해 최근엔 대규모 창고까지 지었는데 넥솔브는 내년부터 핏플랍을 판매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LF(구 LG패션)와 영국 본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넥솔브는 판매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넥솔브 측은 “계약 갱신기간을 늘리는 협상 중에 LF와 계약을 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LF와 영국 본사를 상대로 핏플랍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고를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LF 측은 “영국 본사로부터 넥솔브와의 계약 종료를 확인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골리앗와 다윗으로 비교되는 이들의 싸움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발굴한 해외 브랜드를 대기업이 뺏어가는 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난다. 하지만 본사 입장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대기업을 택하는 것이니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보호할 순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브랜드 수입에 매달리지 말고 자체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