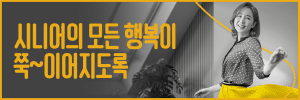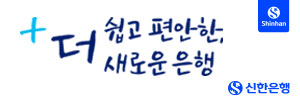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라응찬 라인’으로 꼽히는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돌아왔다. 신한금융 권력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요신문DB
신한금융에 따르면 서 전 은행장은 ‘신한은행 경영고문’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역을 맡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 전 행장에게 예우 차원에서 ‘부회장’ 직함을 부여했다. 행장, 부행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임원들에게 임기 1년의 비상근고문을 맡도록 하는 관례를 따르되, 조금 더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신한금융 측 설명이다.
서 전 행장은 지난 2010년 중도 퇴진한 이백순 행장의 뒤를 이어 신한은행장에 올랐다. 2012년 3월에는 전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임기 3년의 행장으로 재선임됐으며 지난 3월 말 연임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1월 2일 시무식 직후 감기몸살 증세로 입원했다가 급성폐렴과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 행장직에서 물러났다.
신한은행은 서 전 행장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두 달여 동안 행장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 뒤 3월 말 조용병 행장(전 신한BNP파리바 사장)을 선임했다. 서 전 행장은 이후 조혈모세포은행(골수은행)을 통해 골수이식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했다.
그런 그가 예고 없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한금융 안팎에선 서 전 행장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 전 행장에 대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그가 건강만 회복하면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전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1983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서 전 행장은 정통 ‘신한맨’ 중 한 명이다. 인사부장, 영업추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7년 신한생명 사장 재직 당시에는 업계 8~9위였던 신한생명을 4위로 끌어올리는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서 전 행장이 신한은행장에 오른 때는 지난 2010년으로, 특히 신한 사태로 흐트러진 조직을 수습하고 조직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차기 리더로 급부상했다. 당시 그는 사내 정치 대신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조직을 운용하면서 내부 신뢰와 주주의 신임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신한금융 수장인 한동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3월 만료된다. 1948년생인 한 회장은 신한 사태 당시 만들어진 ‘나이 제한(70세 이하)’ 규정에 걸려 연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가 됐든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찌감치 서 전 행장이 유력 후계자로 낙점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하차하고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조 행장이 신한금융의 양대 산맥인 ‘라응찬 라인’과 ‘신상훈 라인’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계파 소속이 아니라는 점은 사실 그가 신한은행장에 오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내분을 마무리 짓는 탕평인사라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금융그룹 전체를 이끌게 될 회장직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룹 내 인맥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 행장이 회장이 될 경우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신한금융의 성골 격인 라응찬 라인은 여전히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선 한동우 회장부터 라응찬 라인으로 분류되고,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김형진 신한지주 부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 그룹 내 쟁쟁한 CEO(최고경영자)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다.
서 전 행장은 이들 가운데 한동우 회장 다음 서열인 2인자에 해당한다. 한 회장이 라응찬 라인 중에서 후계자를 고른다면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라응찬계 CEO들이 아직 은행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서 전 행장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니만큼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장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다.
가장 큰 변수로는 서 전 행장의 ‘건강’이 꼽힌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됐다고는 해도 항암치료 등을 받은 만큼 그의 건강이 어디까지 허락될지는 미지수다. 서 전 은행장의 좌우명은 ‘무지명 무용공(無知名 無勇功)’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장수는 이름이 없고, 용맹도 공적도 없다’는 뜻이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겠다는 그가 마지막에 어떤 ‘이름’을 남길지 지켜볼 일이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