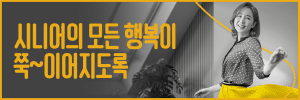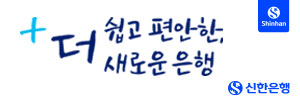지난해 5월 경남 창원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공장에서 개막한 ‘제10회 두산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영구채란 만기가 없거나 100년처럼 아주 길게 설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 즉 갚아야할 빚이지만 만기가 없기에 주식과 같은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배당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식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손쉬운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먼저 영구채는 주식처럼 의결권도 없을뿐더러 유상증자 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엄연히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된다. 자본을 늘리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이런 신통방통한 영구채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지난 2012년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를 두고 한바탕 ‘정체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에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선택권)이 붙은 것을 근거로 5년 만기 회사채, 즉 ‘부채’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국내 회계 전문가들도 두산 영구채의 자본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금융위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두산 측의 반발로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으나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결국 공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 넘어갔고, 2013년이 되어서야 IASB는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발행한 영구채를 재무제표 자본 계정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명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두산의 투쟁(?) 덕분에 다른 기업들도 영구채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많은 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발행한 영구채의 금리가 너무 높고 콜옵션 행사 시기가 2~3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풀무원식품의 영구채는 금리가 6%다. 또 3억 달러를 발행한 대한항공은 콜옵션 시기가 3년인 데다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것이 논란이 됐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2012년 발행한 영구채 콜옵션 행사 기간이 2017년 10월에 도래한다. 만약 이때 두산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돈을 갚지 않으면) 현재 배당률 3% 초반(미국 국채 5년물에 2.65%포인트(p)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발행)에 연 5%p의 금리가 더해진다. 여기서 또 2년이 지나면 연 2%p의 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최고 연 10%를 넘어설 수도 있다. 바로 스텝 업(Step Up)조항 때문이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 조항을 넣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구채 발행 시 처음부터 무리하게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도 없다. 궁여지책으로 스텝 업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물론 두산인프라코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과도한 이자를 지급할 일은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볼 때, 두산인프라코어가 2017년에 콜옵션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두산 측은 여유만만하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017년에 콜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5000억 원(5억 달러) 정도가 재정적으로 큰 위험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영구채의 정체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원지는 바로 신용평가사들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비우량기업 영구채에 대한 자본성을 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장기간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때문에 신평사들은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이 2~3년 후부터 시작되는 영구채에 대해서는 회사채(부채)로 간주하고 신용등급을 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상 낮은 부채비율을 보인다 해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평사들이 영구채를 활용한 기업의 ‘회계 조작’을 더 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영구채 발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영구채 콜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한다. 만약 이때 두산인프라코어가 영구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콜옵션 미행사) 투자자는 두산 측에 신용을 공여한 은행에게 이를 강제로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이 그 대상이다. 부채나 다름없는 영구채를 은행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영구채로 인한 연쇄 부채 급증 사태로 이어져 은행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2월 중순 ‘20대 신입사원 희망퇴직’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다. 또 최근에는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매각했다. 기업의 인력 감축과 사업부 매각은 결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 강구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이번 영구채 발행은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7년 밥캣 인수 때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진통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언제까지나 진통제로 연명할 수는 없다. 또 한 번 박 회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정재훈 기자 Julia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