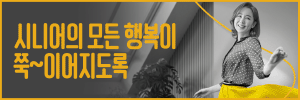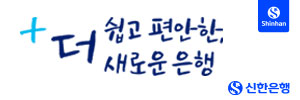그러나 2016년에 몰아닥친 위기는 지금까지 현 회장이 겪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지키느냐 뺏기느냐 차원이었다면 현재 위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룹의 상징인 현대상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데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현대아산이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보인다.
위기의 진원지는 현대상선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대상선의 영업적자는 지난 2011년 3673억 원, 2012년 5096억 원, 2013년 3626억 원, 2014년 23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25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부채비율은 980%에 달한다.
현대상선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해운업 불황’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한 한진해운의 실적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급기야 현대상선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자본 총계 대비 자본금 비율이 2014년 65.2%에서 지난해 36.8%로 낮아졌음을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50% 이상 자본잠식 발생’을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주가는 지난 12일 247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등급도 하락했다. 유상증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사된다 해도 큰 자금을 끌어오기 힘들다.
현대상선의 독자생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채권단에서도 현대상선에 추가 지원이 힘들다는 견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기 처방에 급급한 자금 지원은 없다”며 “현대상선의 전체 채권 중 은행 채권은 3분의 1에 불과해 은행이 움직인다 해도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용선과 운임의 관계’다. 채권단에 따르면 해운업 호황 시절 현대상선은 비싸게 배를 빌렸다. 그런데 운임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운임으로 용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지금 구조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것.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한 현정은 회장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힌다. 현대그룹은 지난 2일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구안에는 현대증권 등 금융 3사 공개매각, 현정은 회장의 사재 300억 원 출연 등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을 방법이 거의 다 포함돼 있는 데다 오너의 의지도 보여줬다. 그러나 채권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싸늘하다. 지난 5일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상선 회사채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두 단계 내리면서 “자구안 검토 결과 자산 매각을 포함한 긴급 유동성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 규모가 올해 차입금을 대응하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현대아산의 출구도 꽉 막혀버렸다. 지난해 10월 이산가족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만 해도 현대아산은 물론 현대상선에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았다. 하지만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현정은 회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현정은 회장이 현대아산 쪽을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북 사업 고립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어서 충격이 덜할 테고 현대상선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기필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