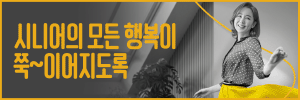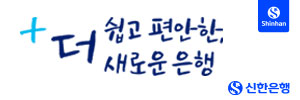롯데호텔 세컨드 브랜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완공을 앞둔 명동L7호텔 외관.
‘L7호텔’은 지난 1월 12일 롯데호텔이 서울 중구 명동에 개장한 ‘부띠끄호텔(4성급)’로 젊은 층을 겨냥한 게 특징이다.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개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지점도 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7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는 L7호텔 2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 사장이 자신할 만큼 L7호텔은 론칭 과정에서 호텔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객실 규모는 245실로 적지만 차별화된 콘셉트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브랜드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이에 객실 유지와 시설 관리를 담당할 아웃소싱 업체들은 롯데와의 계약에 군침을 흘렸다. L7호텔과 별개로 롯데호텔은 비즈니스 브랜드인 ‘롯데시티호텔’의 지점을 늘리고 있다. 유지·관리업자에게 L7호텔 사업권 유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시티호텔 사업권까지 넘볼 수 있는 기회다.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듯 롯데호텔이 진행한 L7호텔 유지·관리 입찰에는 많은 사업자가 몰렸다. 롯데호텔은 지난해 7월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해 9~10월 객실 관리 업체와 시설 관리 업체를 각각 선정했다. 당시 심사에서 롯데호텔은 2016년 1월 개장될 롯데시티호텔명동의 유지·관리 사업자도 함께 뽑았다. 객실 관리 업체는 주로 청소를 대행하며, 시설 관리 업체는 건물 유지를 담당한다.
롯데시티호텔명동 객실 관리 사업권이 A 사에게 돌아가자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A 사는 롯데 출신 임원을 데려다 영업하는 데라 (롯데가 발주하는) 웬만한 사업은 다 따낸다”고 주장했다. 법인등기부상 경기 성남에 소재한 A 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에 따르면 A 사의 2014년 연매출은 973억여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용역 수입 비중은 956억여 원으로 절대적이다.
이 호텔 시설 관리 사업권을 따낸 B 사 역시 롯데호텔 총지배인 출신이 대표이사다. B 사는 이 대표를 영입한 2012년부터 제주롯데리조트와 롯데마트 10곳의 시설 관리 사업권을 받았다. B 사의 2014년 연매출은 19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뉘앙스는 서로 다르지만 일종의 ‘전관예우’가 실재한다고 전했다. L7호텔 객실 관리 입찰을 따낸 C 사 측은 지난 3일 “전관예우가 아닌 평사원들에 대한 배려로 봐야 한다”며 “롯데 출신이 있는 경우 플러스 2점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호텔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수급 과정에서) 전관예우는 물론이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입찰 진행 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 민간업자 간의 계약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약과 달리 전관예우 잣대를 준용하긴 어렵다. 말 그대로 ‘민간’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입찰은 여러 뒷말을 부른다. 예상치 못했던 업체가 입찰을 따냈다면 뒷말은 더할 수밖에 없다. L7호텔 객실 관리 입찰을 따낸 C 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권력층 청탁설이 그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7호텔 객실 관리 입찰은 청소 인력 관리에 필요한 IT 기반 알고리즘 구축 등이 제대로 돼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C 사가 롯데로부터 청소 용역을 따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지난해 7월께 청와대 인사가 L7호텔 입찰 등과 관련해 롯데 측에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청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롯데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과 C 사 측은 한 목소리로 ‘외압설’을 일축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명동 L7호텔의 경우 객실이 적기 때문에 세세하게 돌볼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신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나뉘어 있고, 입찰 심사위원도 여럿이라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청와대에서) 그런 일로 전화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C 사 측 입찰 담당자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우리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경쟁업체와 달리) 우리는 롯데 출신 임원이 없지만 나는 롯데 본점과 15년 넘게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다”며 “연고 없는 회사가 입찰을 따냈으니 오히려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3일 “금시초문”이라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청와대의 이름을 사칭한 일부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과 외압설 모두 뿌리는 입찰 시스템의 ‘신뢰’와 연결돼 있다.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됐다면 청와대 외압설은 힘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를 제외하고 전직 임원 관련 업체와 대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은 “거래 조건의 차이가 있는 부당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유로 본다”며 “거래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