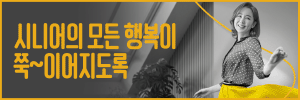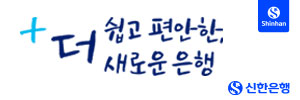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교보생명
IFRS4 2단계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기준을 맞추려면 더 많은 유보금을 쌓아야 한다. 실제로 오는 2020년 도입되는 이 제도 때문에 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상장 후 주가 역시 비슷하다.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상장한 보험사는 대부분 주가가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보 역시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교보생명의 이런 발표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우선 IFRS4의 경우 상장하면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투자자금이 들어와 재무를 개선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라는 교보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장 후 주가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들의 원성을 살 수는 있지만 보유 중인 지분을 당장 팔 것도 아닌 대주주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보생명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인사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창재 회장이 상장으로 인해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질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 사례처럼 자칫 외부 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상장사임에도 신창재 회장 일가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50%에 못 미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신 회장이 33.78%를 보유 중이며, 사촌동생인 신인재 필링크 사장이 2.53%, 여동생인 신경애 씨와 신영애 씨가 각각 1.71%와 1.41%씩 갖고 있다. 진영채 교보리얼코 사장이 보유 중인 0.1%를 더해도 특수관계인 지분은 39.45% 수준이다. 여기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수출입은행(5.85%), 우리사주조합(0.99%)까지 합치면 신 회장 측 지분은 모두 46.29%로 평가된다.
문제는 다른 주주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의 2대주주는 9.93%를 보유한 타이거홀딩스라는 해외 펀드다. 신 회장 측 지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펀드 외에 여러 다른 해외 펀드들이 비슷한 양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커세어코리아, 가이던홀딩스, KLI, 헤니르유한회사, KLIC홀딩스, 5개 해외 펀드들은 교보생명 지분을 각각 5.53~9.79%씩 보유 중이다.
‘재무적 투자자(FI)’로 불리는 이들이 가진 지분은 총 44.56%로 우호지분까지 더한 신 회장 측 지분율 46.29%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주식 492만 주를 매각할 당시 이를 매입했던 펀드들이다.
이들이 비상장사인 교보생명 지분을 대거 사들인 이유는 상장 시 지분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까지 교보생명을 상장시킨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다른 일부는 상장이 무산될 경우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후계구도를 위해서라도 비상장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일요신문DB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가치는 1조 2000억 원가량으로 이 정도 금액은 지난해 삼성그룹을 위협했던 엘리엇의 경우처럼 글로벌 대형 펀드는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액수”라며 “상장되면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는 만큼 블록딜(대량매매) 등을 통해 우선 44%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7%만 더 사 모으면 51%가 된다.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그리고 굳이 상장을 피하지 않아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일정한 값을 쳐주고 사들이면 불씨를 깨끗이 없앨 수 있다.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 부담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자 중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것은 다른 펀드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신 회장은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꺼번에 동원해야 하는 셈이다.
교보생명 경영에 나서기 전까지 의사의 길을 걸었던 신 회장의 현금 동원력이 그리 크지 않다. 지난 2003년 부친 작고 이후 진행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식으로 대납했을 정도다. 교보생명 경영에 나선 뒤 매년 수억 원의 연봉과 수십억~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고 있지만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상장으로 주식이 분산될 경우 후계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953년생인 신 회장은 올해 63세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신 회장은 슬하에 신중하(35), 신중현(33), 두 아들이 있지만 지난해에야 장남 중하 씨가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에 대리로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게다가 두 아들은 교보생명 지분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은 교보생명이 상장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굳이 상장을 단행해 위험에 노출되기보다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번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금융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라는 회사 자체는 재무구조도 좋고 사업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상장할 필요는 크지 않다”면서 “후계구도를 위해서라도 비상장 상태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평했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