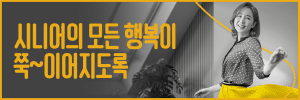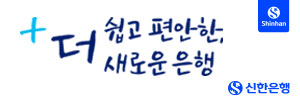차를 살 때 흔히 듣는 말이다. 과연 길들이기는 필요한 것일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새 차를 사고 나면 길들이기 속설에 솔깃해진다. 사진은 최근 출시된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주행 장면.
차 길들이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동차의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길들이기의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엔진을 보호하는 것인데,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초고속으로 왕복운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시속 100㎞ 안팎으로 정속 주행하는 자동차의 rpm(분당 회전수)은 2000~3000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3000이라고 하자. 이를 60초로 나누면 초당 50회전이다. 스포츠카처럼 최대 rpm이 9000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초당 150회의 피스톤 왕복운동이 이뤄진다. 일반 차량이라도 급가속으로 rpm을 60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경우의 실린더 왕복 속도 초당 100회는 인간 지각능력 밖의 수치다. 지난 2013년 크레용팝이 ‘빠빠빠’로 데뷔할 때 보여준 ‘5기통춤’이 이름에 걸맞으려면 적어도 초당 10회 이상씩은 점핑을 해야 할 것이다.
차 길들이기의 최대 이유는 바로 이 실린더와 피스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각기 다른 협력업체에서 제작해온 엔진블록, 피스톤, 피스톤링, 엔진헤드 등을 조립하다 보면 미세하게 어긋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 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제작사의 역량이다. 이 간격들은 주행 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미세하게 마모되면서 설계자가 의도했던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rpm을 올리면 엔진부품들이 궁합을 맞추기도 전에 필요 이상으로 깎여버리게 되고 그 틈으로 기화된 연료가 샐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엔진오일이 막(코팅)을 형성하기 때문에 연료가 새지는 않겠지만, 마모가 세게 일어나면 코팅이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10~20년 전에 비해 지금은 금속 가공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을 들여 길들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엔진블록은 주조업체에서 대략의 엔진모양을 만들어 오면 절삭업체에서 실린더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거친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손기술을 타고난 오랜 경력의 장인이 있어야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 당시 독일, 일본, 미국의 자동차들이 한국 차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100년 안팎의 자동차 제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완성도 때문이었다.

2000년 이후 기계공업에 CNC 머신이 보급되면서 자동차 제조기술은 상향평준화됐다. 최근의 자동차들은 예전처럼 길들이기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
아날로그적 기술 격차를 일거에 해소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기계산업에 보급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컴퓨터 수치 제어) 머신 덕이었다. 그 이전에는 엔진부품을 목업(Mokup·실물모형)으로 만들고 복제 머신을 통해 동일한 부품을 깎아냈다. 열쇠 복제 기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CNC 머신이 등장하면서 다차원의 컴퓨터 좌표만 입력하면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즉 자동차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일거에 해소된 셈이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쏘나타(NF) 출시 이후 눈부신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5위 메이커로 발돋움한 것도 CNC 머신 덕이라 할 수 있다.
옛날 방식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 목업 제작 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목업을 기준으로 실제 쇳덩어리를 깎을 때 또 한 번 오차가 발생한다. CNC 이후 기계공업은 상향 평준화되면서 손기술보다는 디자인, 상품기획, 애프터서비스 등 무형의 요소가 자동차 가격의 결정 요소가 됐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차 길들이를 하면 좋다. 다만 과거에는 길들이기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10%라고 가정하면 지금은 1~2%의 차이 정도로 기술 발달이 오차를 커버하고 있다.
차 길들이기의 두 번째 이유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선수들은 몸만들기를 하는데, 몸 상태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최적의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무리한 주행을 하면 차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레이크의 예를 들어보자. 브레이크 패드를 카센터에서 교체하면 정비공들이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밀리니 조심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의 접촉 면적이 최대화돼야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주행하고 나면 패드가 마모되면서 디스크와 ‘쫀득하게’ 붙는다. 그 이전까지는 무리하게 자동차를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브레이크 패드 또한 과거에 비해 출고 시 편평도가 잘 맞춰져 있기에 과거보다는 최적화 기간이 많이 줄었다.
비단 엔진과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흡입기관, 배기기관 등 자동차 내에서 서로 맞물리는 모든 기계부품들은 어느 정도의 주행을 통해 최적화된다. 조향장치는 운전대와 연결된 피니언과 앞바퀴에 연결된 랙이 톱니로 맞물리는 원리다. 트랜스미션은 수많은 기어(톱니) 맞물림의 집합이다. 서스펜션 바(Bar)는 하나의 봉이 다른 봉 사이를 오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
개별 부품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섀시, 엔진, 트랜스미션, 디퍼런셜 기어(차동장치), 등속조인트 등 구동 모듈 사이에도 궁합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계를 정밀하게 하더라도 실제 부품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행거리가 쌓이면 그 오차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페인트 또한 재료기술의 발달로 건조와 안착이 빨라졌고, 마모에도 강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두세 달 동안 브러시로 세차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비싼 차는 페인트도 좋은 제품을 쓸 것이므로 내마모성이 더 강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도색의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행거리가 3000㎞가 될 때까지 rpm이 2000을 넘으면 안 된다’라거나 ‘세 달 동안 기계세차를 하면 안 된다’는 속설 같은 길들이기의 필요성은 많이 줄었다. 지난 10~20년 사이 기계공업 기술과 재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굳이 길들이기를 하고 싶다면 급가속, 급제동, 과속만 하지 않으면 자동차 스스로 길들이기를 완성할 것이다.
우종국 자동차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