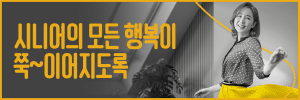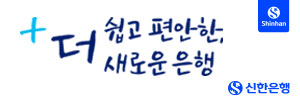공정위는 지난 1일 ‘2016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는 공기업(SH공사)을 제외하고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가 신규로 포함됐으며 홈플러스와 대성그룹이 제외됐다.

전북 익산의 하림 공장. 사진제공=하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카카오는 지난해 각각 팬오션과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해 신규 지정됐으며, 한국투자금융은 비금융사 인수로 금융전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또 셀트리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산이 증가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하면서 새로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는 지난해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자산이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쟁점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자산 5조 원’이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마어마한 규제가 뒤따른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법령은 무려 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즉시 30개가 넘는 규제가 추가된다.
재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 허창수)는 이미 지난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 원이 현재 우리 경제 규모와 맞지 않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경련이 요구한 기준은 자산 10조 원이다.
1987년 자산 4000억 원을 기준으로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93년 ‘상위 30대그룹’, 2002년 자산 2조 원으로 그 기준이 변경됐다. 현재의 자사 5조 원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건 2008년. 2조 원 기준에서 5조 원 기준으로 상향하는 데 6년이 걸렸던 만큼 2008년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공정위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3일 ‘20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위 입장에서도 관리 범위가 많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을 생각하면 (자산 규모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서초타운. 삼성그룹은 자산 348조 원으로 대기업집단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전경련과 공정위 주변이 시끄러운 것과 달리 정작 재계 관계자들 중에는 이 같은 요구에 무덤덤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삼성, 현대차, SK, LG를 비롯해 자산 규모가 수십조~수백조 원인 그룹들의 관계자들은 “워낙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30년 전부터 (규제를) 받아온 일이고 관련 업무를 해온 터라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없다”며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선에 걸려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기업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이다.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벤처로 출발한 카카오 같은 기업까지 수십 개의 규제를 가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3월 “성장을 마냥 즐겁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 직후 하림은 “법적·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들은 당장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다.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데다 총수의 친인척 관리도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 기업 관계자는 “상호출자 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지배구조 변화 등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고 해도 평소 왕래가 없던 오너의 먼 친인척들의 움직임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 힘들다”며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계인에 포함된 그들의 인적사항과 주식 보유 변동 사항, 계열사와 방계기업의 지분구조 등을 파악하느라 계속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한 기업은 최근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 중이던 M&A(인수합병)마저 잠시 보류했다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반대로 기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홀가분할 수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순간 실무진의 페이퍼웍이 급격히 늘어나며 기업 전체적으로도 자회사를 두기가 까다로워지는 등 골치 아픈 부분이 많아진다”며 “심지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M&A를 하지 않거나 사업 확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도 있다”고 귀띔했다. 기업에도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는 얘기다. 즉, 사업을 확장해 기업을 키우기보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계에서는 10조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공정위 등에서는 7조 원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공정위 발표를 근거로 하면 10조 원 기준일 경우 하림·KCC 등 15개 기업(공기업 제외)이, 7조 원 기준일 경우 태영·아모레퍼시픽 등 9개 기업(공기업 제외)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대부분 기업이 제외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초 대기업지정 제도를 시행한 취지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앞의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배구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확실히 경영이 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상향한다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격차에 따른 차등 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자산이 348조 원인 삼성과 5조 1000억 원인 카카오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 실제로 자산이 수십조~수백조 원인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다. 재계에서는 4·13총선 이후 대기업지정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