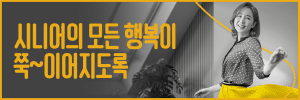골드만삭스, 알리안츠 등 세계 금융시장 강자들이 잇달아 ‘굿바이 코리아’를 선언하고 있다. 그래픽=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1년여 전인 지난해 봄, 한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해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굿바이 코리아’를 선언한 주인공은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으로, 당시 이들은 서울지점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RBS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낯선 이름인 탓에 한국 철수 선언이 큰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이 받은 충격은 컸다. RBS는 자산 규모가 무려 2470조 원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JP모건체이스를 뛰어넘는 세계 8위의 초대형 금융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것은 2009년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철수 이후 6년 만의 일이었다.
금융 전문가들이 ‘불길하다’며 걱정하던 징후는 올해 들어 현실이 됐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 한국 내 은행 부문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서울지점의 면허를 반납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의 주력은 파생상품 판매인데 은행 면허를 반납하면 외환거래 등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는 셈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분기까지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자를 낸 것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만족스런 성적표라고 보기 힘든 수치다. 금융권은 골드만삭스의 이번 결정이 ‘한국은 돈 안 되는 시장’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상징하는 ‘왕관 쓴 사자’의 주인인 바클레이즈도 한국과 결별을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서울에 있는 은행과 증권지점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인가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영국계 대형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1977년 한국에 진출해 무려 39년 동안이나 서울지점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비용 감축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 철수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바클레이즈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홍콩, 중국, 싱가포르 지점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지만 이들 나라는 손을 대지 않고 유독 한국지점만 은행과 증권 모두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바클레이즈의 철수 작업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 중 터줏대감 격인 바클레이즈가 지점 폐쇄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거래관계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 끝나면 인가를 반납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스위스은행 비밀금고’의 대명사 격인 UBS도 한국에서 은행 비즈니스를 접고 증권업으로 금융사업을 통합키로 했다. UBS는 지난 4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 내 사업구조를 UBS증권 서울지점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 집중해 역량을 최적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UBS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제공되던 주식, 외환, 신용 등 고객 서비스는 인근 국가와 타 지역의 지점으로 넘어가게 됐다.
16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UBS는 총자산이 300조 원을 넘는 스위스 1위 은행이다. 한국에는 1994년 서울에 증권업 인가를 받고 지점을 내면서 처음 진출했고, 1998년에는 은행지점 인가도 받았다.
은행들만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생명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 알리안츠는 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알리안츠그룹은 지난 17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지만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새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급전직하하자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본사가 술렁일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 금융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금융사 중에도 떠나는 곳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싱가포르화교은행(OCBC) 계열사인 BOS증권은 최근 한국지점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한국에 진출한 지 불과 6년 만이다.
싱가포르 2위 은행인 OCBC는 주로 국내 거액 자산가와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신흥국 채권·외환상품 등을 판매하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한국 진출 후 6년 내리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독일 최대 금융그룹인 도이체방크, 영국 최대 보험사인 PCA생명도 한국 철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규모가 작은 데다 정부의 규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해 대형 금융사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수익성마저 위축되면서 돈 벌기가 더욱 힘든 시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임원은 “비유하자면 한국시장은 고래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에게 시냇물 같은 곳”이라면서 “가뜩이나 헤엄치기 좁은데 곳곳에 규제라는 그물까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굴지의 금융사들이 동시에 한국을 떠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시장 파악이 빠른 이들 금융사가 한국시장에서 무언가 ‘조짐’을 감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선·해운업 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불똥이 금융권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에 빌려준 거액의 대출이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바뀔 경우 금융사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내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사 중 불과 몇 달 전까지 철수 계획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짐을 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철수결정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금융권은 부실기업들의 뒷감당을 해야 하는 속칭 ‘시체처리 문제’가 화두”라면서 “금융위기 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불길한 징조는 아닐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