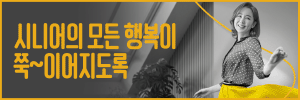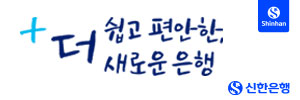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1990년대 중후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재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윤 아무개 씨는 2000년대 들어 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사표를 쓰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P 사를 차렸다. P 사는 ‘전화번호 검색 서비스’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기술도 여럿 개발했다.
그러나 윤 씨가 만든 기술은 ‘제값’에 거래되지 않았다. 여러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헐값에 기술을 빼앗거나 ‘카피’했다는 것이 윤 씨 주장이다. 또 윤 씨는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서 핵심 기술과 유능한 인재를 빼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P 사와 같은 스타트업은 닷컴 버블이 꺼진 1999년 이후 국내에 등장했다. 주류 벤처업계는 이때를 황금기로 묘사한다. 스타트업을 후원하는 ‘엔젤 투자’ 규모만 549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필요한 만큼 투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으로는 반 년도 버티기 힘들었다고 한다.
벤처 열풍은 부는데 투자는 특정 기업에만 몰렸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 정권 말기 이른바 ‘4대 벤처 게이트’(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가 터졌다. 투자를 빌미로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이때를 ‘암흑기’로 정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벤처시장은 스마트폰 출시 전과 후로 나뉜다. 스마트폰 출시 전까지 국내 벤처업계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스마트 혁명’이 불면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10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창조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국내 벤처시장의 외형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4월 1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5년 벤처펀드 투자액’은 2조 626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2조 858억 원) 및 투자업체 수(1045개) 또한 전년 대비 각각 27.2%, 16.0% 증가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34조 6650억 원)에 이르는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가 적다는 것은 스타트업 시장의 촉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청년의 창업 희망 선호도는 한 자릿수(5~7%)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엑시트(Exit)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엑시트는 스타트업을 키워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페이스북의 IPO(기업공개)도 한 예다. 엑시트는 인수자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스타트업 평가에 인색하다.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도입한 카카오가 눈에 띄지만 전체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국내 스타트업 중 성공 사례로 꼽히는 회사 또한 드물다.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주)우아한 형제들은 회사 볼륨을 키우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249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 골드만삭스로부터 후속투자는 유치했지만 국내 기업의 투자가 많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