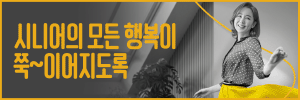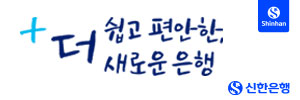시트는 얼핏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기술들의 집합체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의 실력에 따라 편안함·실용성에서 차이가 난다. 한 예로 닛산 알티마는 ‘무중력 시트’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서 힘을 뺐을 때 가장 편안해지는 자세를 시트로 재현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타 본 결과는 그다지 편안함의 차이를 체감하진 못했다. 오히려 도요타의 캠리처럼 라텍스 느낌에 가까운 쿠션을 쓰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즉 각도와 재질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에 따라 차마다 추구하는 편안함이 다르다.
앞서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세단의 경우다. 스포츠카로 갈수록 시트는 단단해지고, 자세를 견고히 잡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나온 것이 ‘스포츠 버킷 시트’인데, 이는 허리 양쪽 부분이 돌출돼 차체가 좌우로 기울어도 운전자의 몸은 시트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양쪽 버킷이 돌출돼 배가 나온 사람은 꽉 끼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장한 것이 ‘세미 스포츠 버킷 시트’다. 완전 스포츠카가 아닌 스포츠 쿠페, 스포츠 세단의 경우 ‘세미 스포츠 버킷 시트’를 적용한 차들이 종종 있다.
기계로서 시트를 바라보면 온갖 기계부품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전동식 시트 조절 장치다. 시트의 전후 위치, 등받이 각도를 스위치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다. 요즘은 저가형 차량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운전석에 전동식 시트 조절 장치가 달렸다. 운전 중 시트 각도와 위치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차는 목받이 높이와 각도까지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다.
다음으로 복잡한 장치는 시트를 데우는 열선 장치다. 많이 보급화돼 그리 비싼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 열선은 시트 내에 발열선을 장착하면 된다. 발열장치는 부직포에 발열선을 재봉틀로 박은 것을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식이다. 열선보다 어려운 장치는 냉각 팬(cooling fan)이다. 시트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팬이 돌면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에어컨을 켜고 팬을 돌리면 찬바람을 빨아들이며 엉덩이와 등이 시원해진다.
그 다음으로 복잡한 장치는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액티브 헤드레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후방 추돌 시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받침(헤드레스트)이 앞으로 돌출돼 머리의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액티브 헤드레스트는 시트 프레임 안에 고정된 철사가 추돌에 의해 풀리면서 헤드레스트를 탄성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복잡한 장치는 사이드 에어백이다. 전방 에어백은 대시보드에서, 커튼에어백은 루프라인에서 나오지만, 사이드에어백은 시트 가죽을 뚫고 튀어나온다. 전방 에어백이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라면 얘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시트 내부에 폭발 압력과 연동된 센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은 단순히 에어백 팽창압력을 줄인 것이고, 2.5세대 스마트 에어백은 차량의 충돌량에 따라 팽창압력이 조절되는 것이다. 3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탑승자의 무게, 시트와 에어백 간의 거리에 따라 에어백 팽창 압력이 조절되는 것으로 시트 내부에 센서를 탑재해야 한다. 2세대 또는 2.5세대 에어백으로 개발된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때 3세대 에어백을 장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트까지 새롭게 개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충돌테스트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시트 내에는 △전동식 조절 장치 △열선 및 팬(fan) △액티브 헤드레스트 △사이드 에어백 모듈 △어드밴스드 에어백 센서 등 많은 기술적인 부품들이 숨겨져 있다. 자동차 연구원으로 입사하더라도 시트 하나를 설계하려면 많은 경험을 쌓아야 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트의 기능적 조건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차의 가치를 높이는 감성적 조건들도 있다. 사람의 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시트이니만큼 재질감이 중요하다. 요즘의 직물 시트는 커피를 쏟아도 물티슈로 닦으면 오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수코팅 등에 신경 쓰고 있다. 고급차는 소가죽으로 외피를 씌우는데, 검은색 일색인 세단도 있지만, 빨간색·황토색 등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또 고급차에는 알칸타라 가죽 같은 고급 소재를 쓰기도 한다.

고급차들은 스티치에도 공을 들인다.
스티치(바늘땀)도 중요한 요소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EQ900을 발표하며 스티치 장인이 감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능적으로 본다면야 바늘땀이 어떻든 상관없겠지만, 최고급차 수준에서 시트는 기계가 아니라 패션에 가깝다. 어떤 색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바느질을 하는가에서 자동차 메이커의 예술적 경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명차들이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트의 끝판왕은 ‘퍼스트 클래스 시트’다.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등 최고급차의 뒷좌석은 그야말로 ‘회장님석’이다. 시트 전후가 30㎝ 이상 조절되고 등받이와 발받침 각도가 조절된다. 시트 내부에 안마 기능까지 넣기도 한다.

고급차의 뒷좌석은 움직이는 호텔로 불릴 만하다. 성공한 CEO가 “하루 취침은 4시간만”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몇 년 전 신형 S클래스가 나왔을 때 뒷좌석에 타 보았다. 너무 편안해서 차를 벗어나기가 싫을 정도였다. 거기서 잠을 잔다면 안방 침대에서 잔 것만큼 개운할 것 같았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들이 하루 4시간만 잔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 그들은 이동 중에 차 안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 하루 4시간 수면을 따라하다가는 역효과만 날 것이다.
우종국 자동차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