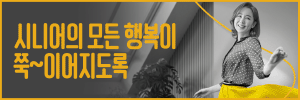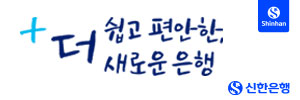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 쉑쉑버거 매장 풍경. 사진 비즈한국
쉑쉑버거 국내 론칭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허희수 SPC그룹 마케팅전략실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10월 31일 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에 이은 승진인데, 식품업계 안팎에선 ‘SPC 3세 경영의 서막이 올랐다’는 말도 나온다. SPC 측은 “지금도 오너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3세 경영’이란 평가가 적절한진 모르겠다”면서도 “(허희수 부사장은) 이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임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립식품을 모태로 둔 SPC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3조 5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룹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말 기준 파리바게뜨 등 187개의 직영점과 367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직접 투자 형태로 설립한 매장을 더하면 운영 중인 점포 수는 4000여 개에 이른다. 중소 제빵회사로 시작해 중견기업을 일군 허영인 회장에게 ‘제빵왕’이란 별명이 붙은 것은 허언이 아니다.
그러나 허영인 회장이 일찍부터 ‘왕좌’를 보장받았던 것은 아니다. 허영인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허창성 삼립식품 창업주는 장남 허영선 씨에게 핵심 계열사인 삼립식품을, 차남 허영인 회장에게 삼립식품의 10분의 1 규모인 샤니를 물려줬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반전돼 삼립식품은 부도를 맞았고, 허영선 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반면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삼립식품을 되찾았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차남이란 핸디캡을 딛고 일어선 허영인 회장의 ‘경험’은 그룹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차남보다 먼저 부사장이 됐지만 장남 허진수 부사장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SPC 파리바게뜨 쓰촨성 청두완상청점. 사진제공= SPC
허진수 부사장은 파리크라상 지분 20.2%를, 허희수 부사장은 12.7%를 각각 갖고 있으나 파리크라상이 ‘비상장 가족회사’인 탓에 언제든 지분 변동이 가능하다. 상장사 삼립식품의 지분율은 허진수 부사장이 11.47%, 허희수 부사장이 11.44%로 큰 차이가 없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경영 승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쉑쉑버거는 차남의 경영 참여 명분과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남 허진수 부사장은 그룹에서 해외 사업 및 제품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차남 허희수 부사장은 해외 사업이 아닌 국내 신사업과 그룹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진수 부사장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해외 제빵 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허희수 부사장은 빵보다 ‘파인다이닝(Fine Dining)’ 사업에 집중해 온 모습이다. 파인다이닝이란 고급화된 외식 문화를 가리킨다.
SPC의 주력 브랜드는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다. 앞으로도 파리바게뜨는 그룹 내 핵심 사업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파리바게뜨의 외연 확대는 ‘제빵’에 정통한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해외 가맹점이 점차 늘고 있으며, 곧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SPC 창립 7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해외 매장 수를 3000개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허영인 SPC 회장.
파리바게뜨는 국내 제과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까닭에 신규 출점이 제한된 상태다. 업체 간 출혈 경쟁 심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은 미래 경영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 대안으로 매장 리뉴얼 등을 통한 점포 단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인 처방은 아니다. 식품업계 화두로 파인다이닝이 떠오른 것은 이처럼 내수 시장이 포화 내지는 침체된 것과 관련이 있다. SPC가 파인다이닝의 ‘첨병’으로 내세운 쉑쉑버거의 향후 실적은 그룹의 다른 신사업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쉑쉑버거의 흥행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의견이 적지 않다. 앞의 식품업계 관계자는 “쉑쉑버거가 돌풍을 일으킨 건 맞지만 기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트렌드와 지속적인 시장 수요는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