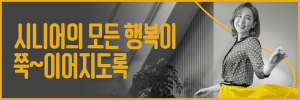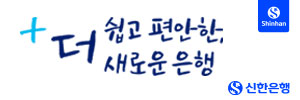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정부 입김 떨칠까’ 시장 우려 종식이 관건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연합뉴스
[일요신문] 우리은행이 ‘쪼개기 지분 매각’으로 15년 만에 민영화를 성사시켰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내년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본격적인 국내금융지주환경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4전 5기 우여곡절 속 민영화 성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등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자 선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공자위 의결을 거쳐 선정된 7개 낙찰자는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로 총 낙찰물량은 29.7%다. 예보의 잔여지분 21.4%를 훨씬 초과한 수치로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예보-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회수하는 공적자금 2조4000억 원을 포함해 우리은행에 투입된 12조8000억 원 중 10조6000억 원을 회수(회수율 83.4%)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해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 투자자는 오는 28일,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는 내달 14일 거래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이사회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오는 12월 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이미 낙찰자 중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개사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1일 우리은행 본입찰 접수 결과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KTB자산운용 등 총 8개 투자자가 33.7% 수준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모든 입찰자가 예정가격을 상회했다. 지분을 4∼8%씩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이 본격적인 민영화 체제 구축에도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광구 행장은 지난 14일 사내방송에서 “2017년 5대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더 큰 도약을 하고자 한다. 금융지주체계를 재구축해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연합뉴스
이광구 은행장의 금융지주 재구축 전략은 민영화 성공을 위해 지주사 해체, 계열사 매각을 했지만, 민영화체제에서 수익성 한계 등 은행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 등 비은행과의 제휴 확대 및 복합금융이 대세인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정부와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민영화 작업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지분 51.6% 중 30.0%를 매각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매각에 성공해도 예보 지분은 21.6% 남는다. 민영 우리은행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집단지배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분 매각 이후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이사의 과반수의 추천권을 과점주주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예보에서 파견한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고 2001년부터 맺어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해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1.6%는 정부가 우리은행에 입김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분은 있든 없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국내 금융사가 정부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KT와 포스코의 경우, 정부 지분이 거의 없지만 낙하산 인사와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금융사인 국민은행의 경우도 이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정부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 과점주주가 한 곳도 없어 민영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중국 안방보험이 참여한 동양생명 정도다.
또한, 이 우리은행장이 아직 주주들의 지분 매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지주사 전환 추진 등을 섣부르게 선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이사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실체 변경을 선언한 것은 주주들을 돈만 내는 사람 취급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차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새로운 주인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자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우리금융 민영화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사에서 안착으로 넘어가기 위해 과점 주주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