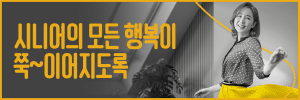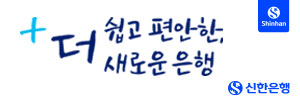1990년대 후반 나타나기 시작한 제3의 물결 커피는 2002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됐으며, 그 후 호주, 영국, 뉴질랜드를 비롯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움직임이 일고 있는 운동이다.
커피 시장에서 제1의 물결(네슬레 등 값싼 인스턴트커피 시장)과 제2의 물결(스타벅스, 커피빈 등 대형 커피 체인점)에 이어 나타난 제3의 물결은 스페셜티 커피(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SCAA)가 실시하는 커피 테이스팅 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고품질 커피)의 확장으로 대변된다. 소규모 지역 로스터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고 있으며, 스페셜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커피를 와인과 같은 장인 식품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인스턴트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넘어 제3의 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블루보틀 커피. 사진=블루보틀 페이스북
제3의 물결을 이끄는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으로는 포틀랜드의 스텀프타운(Stumptown), 시카고의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블루보틀(Blue Bottle)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선두주자라고 하면 단연 블루보틀을 꼽을 수 있다.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 블루보틀은 애플이다.”
‘트루 벤처스’의 토니 콘래드의 말처럼 블루보틀은 여러 면에서 애플과 닮아 있다. 우선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먼(49)부터가 그렇다.
오클랜드 출신인 프리먼은 음대 졸업 후 10년 동안 프리랜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했다. 2001년 연주자로서의 삶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평소 관심이 많던 커피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 블루보틀은 애플.” 블루보틀의 성공 비결로는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가운데)의 품질 최우선주의가 꼽힌다. 사진=블루보틀 페이스북
클라리넷을 집어던진 프리먼은 집 근처의 작은 창고를 임대한 후 로스팅 기계를 사들였다. 자신만의 커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원두를 볶으며 온도, 날씨, 시간, 추출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원두의 특성상 다양한 시도를 했다. 단, 원칙은 있었다. 한 번에 작은 분량의 원두만 볶아서 24시간 안에 판매한다는 것. 처음에는 배송 판매 서비스부터 시작했다. 고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원두를 정기적으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커피 전문점 형태로 방향을 바꾼 프리먼은 창고에서 로스팅한 원두와 직접 개발한 커피 추출 기계를 차에 싣고 토요일마다 열리는 버클리 지역의 농산물 장터로 나갔다. 작은 손수레에서 커피를 만들어 파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커피는 주문을 받은 후에야 원두를 분쇄하고, 이렇게 분쇄한 원두를 커피 추출기를 이용해 천천히 내리는 ‘느린 커피’였기 때문. 주문한 후 1~2분 내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당시의 빠른 서빙 방식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이런 도전은 성공했다. 커피 맛에 매료된 사람들이 다시 손수레를 찾았고,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프리먼의 손수레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블루보틀 커피에 대한 입소문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2005년 프리먼은 샌프란시스코 헤이즈밸리에 있는 친구의 집 차고에서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블루보틀 커피 1호점이었다. 이곳은 기존의 커피 전문점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최고 품질의 원두인 스페셜티 커피만 사용하고, 주문을 받은 후에 커피를 분쇄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색달랐다.
때문에 커피 메뉴는 여섯 가지로 단순화했으며, 컵 크기도 한 가지로 통일했다.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곧 그의 가게 앞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가운데는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많았다.
프리먼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열광적인 인기에 힘입어 차례차례 다음 지역을 물색해 나갔다.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블루보틀은 현재 고향인 오클랜드를 포함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뉴욕, LA, 도쿄 등 6개 도시에서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직영으로 품질 및 매장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블루보틀은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뉴욕, LA, 도쿄 등 6개 도시에 30개 매장이 있으며, 모두 직영으로 품질 및 매장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사진=블루보틀 페이스북
소규모 스타트업 커피 전문점이던 블루보틀이 투자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블루보틀이 받은 투자금액은 1억 2000만 달러(약 1400억 원). 모건 스탠리, 인덱스 벤처스, 트루 벤처스, 구글 벤처스 등 굵직한 투자사들이 투자했으며, 특히 미국 최대 규모의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의 경우, 지난 2015년 7000만 달러(약 835억 원)의 펀딩에 성공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IT기업이 아닌 커피 업체가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밖에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와 인스타그램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을 비롯해 배우 자레드 레토, U2의 보노, 프로 스케이트보더 토니 호크 등 유명인사들까지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블루보틀이 커피 애호가들은 물론 투자가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 대다수 투자가들은 창업자인 프리먼의 ‘창업 마인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품질을 최우선시하는 고집스런 완벽주의 때문이란 것이다.
“내 커피는 매일 더 좋아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프리먼은 투자금을 품질 향상에 가장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품질 관리자들은 CEO인 프리먼에게 직접 보고한다. 프리먼이 제시하는 커피 원두의 기준은 엄격하기 그지없다. 원두는 볶은 후 4일 안에 소비되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날짜는 3일 안이라고 프리먼은 강조한다.
이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프리먼은 전 세계 농부들과 직접 연락한다. 가장 맛있고 가장 친환경적인 커피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간다. 프리먼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 친구인 제이 에가미는 “그의 고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루보틀이 일반적으로 커피 회사의 주요 수익원인 원두 도매 사업을 중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오로지 직영 소매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블루보틀 바리스타가 되려면, 프리먼 앞에서 추출 시연을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커피를 내리면서 고객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친절한 조언을 해준다. 사진=블루보틀 페이스북
또 블루보틀에 입사 지원하는 바리스타들은 반드시 프리먼 앞에서 마지막으로 커피 추출 시연을 보여야 한다. 이때 프리먼은 바리스타들의 커피 추출 실력과 함께 커피를 대하는 자세를 함께 본다. 도쿄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프리먼은 모든 바리스타를 직접 뽑았으며, 일본 사람들의 커피 문화에 맞춰 매장 운영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블루보틀 본연의 모습을 지켰다.
블루보틀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또 있다. 아무리 커피를 몰라도, 혹은 커피 맛을 몰라도 블루보틀 직원들 앞에서는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블루보틀 직원들은 커피를 내리면서 고객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친절한 조언을 해주곤 한다. 원두의 출처를 안내를 해주거나 커피 추출 방법도 소개해준다.
커피를 대하는 직원들의 진지한 자세가 맛있는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커피의 세계로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커피를 대하는 직원들의 따뜻하고 진지한 자세야말로 블루보틀 신화의 밑거름이 된 건 아닐까.
김민주 해외정보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