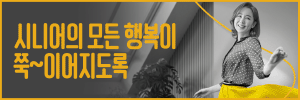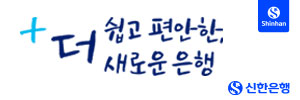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환전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박 아무개 씨(58)는 지난 연말 미국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환전하는 것을 깜빡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박 씨는 급한 대로 공항 내 환전소를 찾아 시중 영업점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외화를 살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돈만 바꿔주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공항 환전소 직원에게 환전 수수료가 비싼 것을 따져 물었지만 대답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나라 돈을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환전할 경우 시중은행들은 저마다 다른 ‘환전 수수료’를 붙인다. 외국환은행의 환율고시방법에 따르면 환전수수료는 항공료·보험료·운송료 등을 포함한 현찰수송수수료에 은행별 마진을 붙여 정하도록 돼 있다. 현행 은행법령상 환전수수료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시중은행은 통상 1.5~3%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들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은행들의 환전수익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환전수익은 2012년 1340억 원에서 2015년에는 21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36억 원을 기록해, 단순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환전수익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환전수익을 은행별로 따져보면 KEB하나은행이 652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리은행 455억 3600만 원, 신한은행 437억 1200만 원, 국민은행 208억 4700만 원 순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환전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은행들은 여행객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공항 환전소의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행객이 급할 때 손쉽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공항 환전소다. 그러나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다. 고시된 기준환율은 같은데, 같은 은행이라도 공항 환전소와 일반 영업점의 환전 매도율(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파는 환율)과 매입률(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사는 환율)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이라도 일반 영업점에서 USD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면, 공항 환전소에서는 11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식이다. 공항 환전소에서 그만큼 마진을 더 챙기는 것이다.
맘이 급한 여행객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공항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때’와 ‘파실 때’의 가격이 점포마다 각각 다르다”며 “공항 환전소는 임대료를 포함한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조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 영업점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기준, 은행별·지점별 환율을 살펴보면 USD 1달러를 매입할 경우 일반 영업점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1184.06원, 우리은행은 1184.16원, KEB하나은행은 1183.55원을 받고 있다. 환전 수수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공항 출국 전 환전소 기준으로는 신한은행 1214원, 우리은행 1213.5원, KEB하나은행 1212.9원 이다. 공항 환전소가 영업점보다 2.5%가량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별 영업지점별 상이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명동 환전소 전경. 최준필 기자
금융업계 일부에서는 환전수수료 중 특히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마진’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거래비용을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한다. 금융 소비자가 직접 은행별 환전 수수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환전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환전 구조에서 발생하는 은행들의 이러한 폭리와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적정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수준의 수수료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의 경우 인터넷 거래를 하거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사용하기는 힘든 서비스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