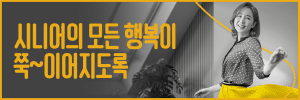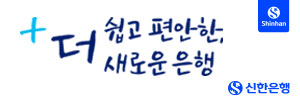28일 삼성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사실상 해체했다.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조직을 해체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대관 업무를 로펌에 맡기기로 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 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조타수 없는 ‘삼성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름. 감옥에 갇힌 채로 조직 쇄신에 ‘풀 액셀’을 밟고 있는 이 부회장의 조급함이 전해진다.
미전실은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비자금 폭로로 해체된 구조본과 이후 생긴 전략기획실을 잇는 조직이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열사 간 업무조정이나 경영진단, 채용, 인수·합병(M&A)은 물론 이에 필요한 대관 업무와 로비, 공보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미전실에는 정부·정치·언론계와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이 중용됐으며, 이들은 이 회장의 수족 역할을 도맡았다. 이 회장이 오랜 기간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미전실 인사들은 사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직을 리드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어왔으며, 보수적인 경영권 승계 절차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을 물려받는 한편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미전실이 항상 걸림돌이었다. 이에 자기세가 약하고 충성그룹의 기반이 빈약한 이 부회장은 시간을 두고 명분을 확보해가며 리더십을 쌓으려 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이 청와대에 로비를 벌여 국민연금 등 국가 시스템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휘둘렀으며, 그 까닭은 삼성전자를 접수하려는 이 부회장의 경영계획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무정차로 달리던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경영업적으로 올리려던 ‘이재용폰’ 갤럭시 노트7도 발화사태로 인해 성과 쌓기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결과만 낳았다.
이런 가운데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에 돌입했다. 현재 가장 큰 줄기는 ‘이건희 지우기’다. 이 회장의 그림자인 미전실을 해체하는 한편, 그 핵심인 대관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CLOSED’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문을 닫는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현관. 박정훈 기자
현재 정리 대상은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차장을 맡고 있는 장충기 사장 등 미전실의 사장단이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실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의 대를 잇는 라인이다. 제일모직-비서실 출신 인사 중용 관행을 깬 콤비이기도 하다.
삼성그룹은 28일 미전실 해체와 관련해 최 부회장과 장 사장 등 사장 및 팀장 5명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도 한 단계 아래인 이준 부사장이 나섰다.
최 부회장은 언론계와 관가에 영향력을 작용하는 인물로, 장충기 사장은 구속된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로비의 직접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정상참작 위해 미전실 해체 등 정경유착 단절 메시지 보여주는 한편, 이 회장의 가신을 정리하려는 이 부회장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가장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정현호 미전실 인사팀장(사장)에게 미전실 직원들의 인사발령과 새로운 조직 구성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전실 직원들은 200여 명으로, 이들은 대기발령 상태며 앞으로 계열사로 퍼질 예정이다. 삼성그룹을 이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출신 인사들이 지고 삼성전자 중심의 인사들이 대거 수뇌부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부친이 이끈 삼성전자 서초 사옥 시대를 끝내고 수원으로 본거지를 옮길 계획이다. 정치권·관가와 거리를 두는 한편 대관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도 수원으로 끌어내려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의 집무실도 수원으로 옮길 전망이다.
미전실이 해체되면 이 회장의 중앙집권식 조직 운영체계가 각 계열사의 독립경영과 이사회 활동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물산 등 건설·중공업 계열로 쪼개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삼성의 과도한 조직 개편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재계 관계자는 “수뇌 조직 없이 10만여 명이 일하는 삼성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지 미지수”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 여건보다는 승계문제에 방점을 찍은 조직 쇄신”이라고 평가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