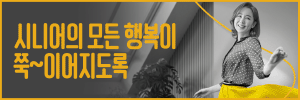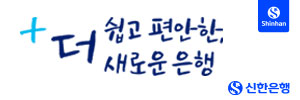지난 2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폐막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가장 식상한 이야기를 꼽자면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였다. 하나하나 제품을 늘어놓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화웨이, 오포, ZTE, 지오니, TCL, 하이센스 등이 갖가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다.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봐도 어떤 게 새로 나온 건지 구분도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중국 스마트폰은 MWC 속 하드웨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ZTE의 Axon7. 사진=최호섭
중국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만나는 중국 제품들은 디자인, 품질 완성도가 매우 높다. 브랜드만 가리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짝퉁을 만든다는 이미지는 벗어난 지 오래다. ‘중국이 제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이야기다. ‘중국이 빠르게 크더라’는 말보다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 PC 시장이 걸어온 길 뒤따라
스마트폰 시장은 PC 업계가 걸어 온 길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다. 규격화된 플랫폼, 하드웨어들은 어떤 기기끼리도 궁합이 잘 맞고, 운영체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환경도 최적화가 잘 이뤄진다. 모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PC가 딱 이랬다. 누구나 PC를 갖고 싶어 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급격히 이뤄졌다. 하지만 하드웨어 성능은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시장과 소프트웨어의 요구를 뒤따라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프로세서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모니터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시장은 크게 반응했다. 최적화 문제 때문에 PC를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여전히 다른 회사 제품들을 떠올리는 디자인 제품들도 있지만 스스로의 색깔이나 기술들도 품고 있다. 무엇보다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오포의 R9s. 사진=최호섭
지금은 어떤가. PC는 용산에서 개별 부품을 사서 조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특정 시장에서는 성능 하나하나를 두고 세세한 평가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급격한 성능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 업계의 고민도 5~6년 된 PC가 느리지 않다는 점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 시장도 똑같다.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시장을 이끌던 기술이 멈추었다기보다,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쪽에 가깝다. 지금도 프로세서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들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몇 달 간격으로 급격하게 닥쳤던 혁신의 분위기와 지금의 공기는 분명 다르다. 웬만하면 쿼드코어에 2GHz대 프로세서, 2~4GB 메모리를 쓰고 풀HD 디스플레이는 기본이다. 2년 전 스마트폰을 지금 써도 불편하지 않다. PC와 비슷하다.

듀얼카메라로 뒷배경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기술들도 들어간다. 지오니 A1이다. 사진=최호섭
# 시장과 제조력 등에 업은 성장
새 제품을 조립해 내는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는 이야기다.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 좋은 옷을 입히면 된다. 전 세계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스마트폰까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그 조합을 다양하게 찾아내고,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것 역시 중국이 가장 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중국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가 먹히는 시장도 강점이다.
디자인과 완성도의 문제는 오랫동안 중국 제품을 괴롭혀 왔는데, 스마트폰에 대중화된 알루미늄 케이스는 그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었다. 새로운 기술들도 빠르게 흡수한다. 아이폰7에 들어간 햅틱 기반의 홈 버튼은 오포, 화웨이 등이 끌어안았고, 대부분의 제품에 듀얼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5배 광학 줌 카메라도 집어넣는다.

재질의 변화와 운영체제의 최적화는 과거 중국에서 쏟아지던 저가 스마트폰과 접근 자체가 전혀 다르다. 하이센스 E76. 사진=최호섭
중국 브랜드에 대한 편견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TCL은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만들고, 레노버도 모토로라 이름으로 모토G5를 내놓는다. 코닥도 중국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등 브랜드에 대한 약점도 퇴색하고 있다.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지한다. 소니와 LG전자 등의 기업들도 품질이나 기술력으로는 가장 위에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과 중국에서 찍어내는 제품 사이의 간극은 사라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운영체제 UX 등 차이점이 있지만 대부분 앱으로 풀어낼 수 있다. 구글이 바라던 안드로이드 시장도 이처럼 어떤 하드웨어를 고르든 구글과 안드로이드의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다.
MWC를 기점으로 중국 스마트폰이 빠르게 추격해 온다는 시선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나름의 시장을 세웠고, 제품으로도 딱히 급을 나누는 게 무의미해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조차 의미 없어진 게 2017년의 스마트폰 시장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기존 터줏대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최호섭 IT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