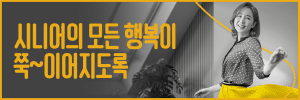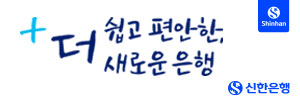미스터피자 가맹본부 MPK그룹이 정우현 회장 소유의 서울 도곡동 부지에 신사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현수막과 대자보를 내걸고 신사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MPK그룹 신사옥 건설 예정 부지는 도곡동 산29-51이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2001년 2월에 매입했다. 1971년 도곡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면서 건축허가가 제한됐고, 신사옥 부지 일부는 비오톱(biotope) 1등급으로 지정됐다. 비오톱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 1등급 토지에는 도시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993년 서울시는 도곡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지를 진입광장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사옥 부지 소유주인 정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서 제외됐다. MPK그룹은 부지 소유주인 정 회장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지불하고, 지난해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신사옥 건설 승인을 받았다.

MPK그룹 신사옥이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매봉산(도곡근린공원)의 자연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도곡공원(매봉산)을지키는주민모임’(매봉삼성아파트, 타워팰리스, 포스코트아파트, SK리더스뷰 등 15개 주민모임)은 강남구청이 정 회장 소유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게 도곡근린공원사업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모임은 신사옥 부지 인근에 위치한 매봉삼성아파트 벽면에 ‘강남구청장은 매봉산 훼손하는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미스터피자 정우현은 도곡공원 파괴하는 건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주변 곳곳에 관련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주민모임 관계자는 “MPK그룹 신사옥이 들어서면 매봉산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공원으로 편입돼야 할 땅에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건 말이 안 된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모임은 대자보를 통해 판결문에 명시된 ‘사건 토지와 매봉산 사이에 도시계획상 폭 8m의 도로가 있어 해당 부지가 매봉산과 연접하여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부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교육정보센터의 토지 및 건물(도곡동 163번지)은 강남구가 수용했으면서, 정 회장 부지만 제외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모임 관계자는 “똑같은 매봉산 연접 부지인데 국제교육정보센터는 강남구가 수용하고, 정 회장의 부지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정 회장 부지에 있던 소나무 9그루와 상수리나무 10그루를 무단 벌채했고, 이 사실을 강남구는 알면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허가를 강남구가 도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MPK그룹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에 비오톱 지정 부지(37㎡, 약 11평)를 기부채납하고 화장실 및 휴게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PK그룹 관계자는 “주택가에 상업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디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터피자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MPK그룹이 정 회장에게 지급할 신사옥 부지 임차료가 배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PK그룹이 정 회장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지불한 건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임차료 규모는 알려진 바 없다.
한 가맹점주는 “정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대점과 서초점을 통해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임차료를 챙기려는 정 회장의 의도가 숨겨진 건 아닌지 모르겠다. 비싼 임차료를 받는다면 이는 배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방배동 사옥에는 사무실이 부족하다. 일부 부서가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유시혁 비즈한국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