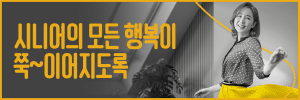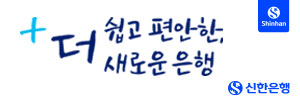21일 개막한 중국 상하이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BMW의 i8 프로토닉 프로즌 옐로우 에디션.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하이모터쇼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면 등장이다. 이번 모터쇼에 새로 등장한 친환경차는 159종이나 된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의 자동차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EV·PHEV 판매는 연간 106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에는 이미 15만 곳의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에 25만 곳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미 대비해 인프라 역시 충분히 깔렸다는 뜻이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번 상하이모터쇼를 계기로 중국 현지 공장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너럴모터스(GM)는 중국 파트너인 상하이자동차와 함께 중국에서 PHEV인 시보레 볼트 뷰익 버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GM은 중국의 전기차 수요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지 공장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폴크스바겐도 장화이자동차와 손잡고 8개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2025년 연간 150만 대의 친환경자동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중국의 EV 판매량은 35만 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EV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판매량이 늘어났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만 보면 중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인 셈이다. 또 친환경자동차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현지 생산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생산 공장 설립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등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 ‘독이 든 사과’를 깨물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술 유출이다.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려면 현지 자동차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법인의 성격과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지분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국 산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지 합작 법인과 정부로부터 기술 공유 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의 친환경 정책이 최근 해외 제조사들의 친환경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강제한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한 경우 차량들의 총 출력에 비례해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시장을 떠나든가, 친환경차를 만들든가 선택하라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 판매 수요를 이끌고 있는 보조금이 2020년 사라질 전망이라, 친환경차 판매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친환경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수급도 문제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본 등 해외 제조사들의 배터리는 인증을 받지 못했다. 만약 해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인 포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부문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더라도 기술유출이나 경영에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