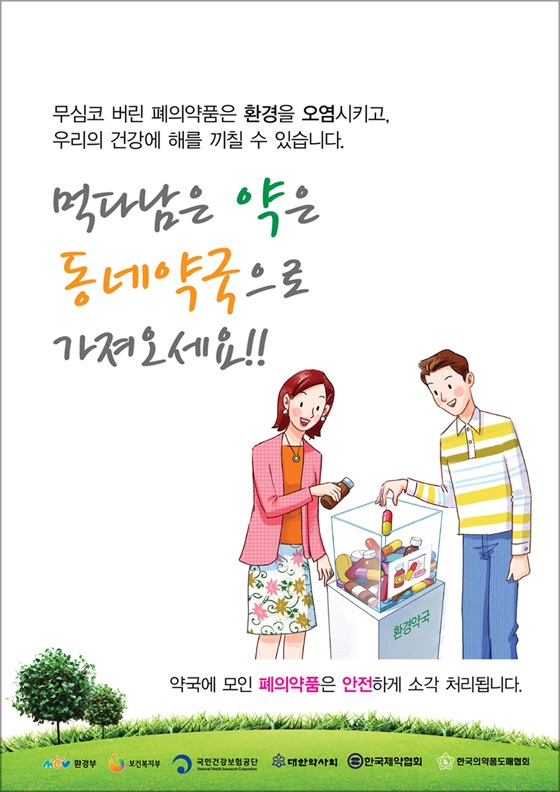
시행 9년째를 맞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여전히 큰 진전이 없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2008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행해왔다. 폐의약품은 아무렇게나 버려지면 토양·지하수 오염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를 별도로 수거해 처리해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준 55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병원, 약국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거둬들인 뒤 소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쌓인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약국과 보건소의 시름이 깊어졌다. 오래 묵은 약품에서는 악취가 났고 액상 약품은 용기 밖으로 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작은 약국의 경우 폐의약품이 차지하는 공간도 무시하지 못했다. 영업과 관련 없는 사업이다 보니 약국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고 조례가 없는 곳도 있어 회수기간과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약국에 쌓인 폐의약품은 지자체에 따라 구청 청소과, 제약업체, 보건소 등에서 거둬 처리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만 주기적으로 거둬도 폐의약품 적체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6개월 이상 거둬 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함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기도 한다. 온라인 상에는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글이 많다. ‘비즈한국’이 서울 시내 몇몇 약국을 방문했을 때도 수거함이 보이지 않아 위치를 문의하자, 먼지가 쌓인 채로 빈 상자와 뒤섞여 구석에 방치되어 있거나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직원 공간에 있기도 했다.

폐의약품이 약국과 보건소의 골칫덩이가 되자 수거함을 방치하거나 수거를 거부하는 곳도 생겼다. 사진=박혜리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약국의 약사는 “지난해까지는 가끔 수거하러 오더니 올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손님이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거부하지는 않지만, 굳이 수거함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이 100% 소각 처리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을 각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약국에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액상 형태의 폐의약품은 새어 나오고 처리가 어려워 소각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액상 형태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해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의 성과용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 도봉구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도봉구는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첫 번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또 3~4개 약국마다 단 한 곳을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수거 날 거점약국에 폐의약품을 한데 모으면 수거차량이 130여 개의 약국을 모두 방문할 필요가 없어 반나절이면 수거작업을 마칠 수 있다.
대한약사협회는 실태 개선을 위해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협회 관계자는 “약사회,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그 목적이 사회적 기여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약국의 의무처럼 여긴다”며 “폐의약품 처리를 외주업체를 통해 하다 보니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 25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까지 대한약사협회 여약사회장을 역임하며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박혜리 비즈한국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