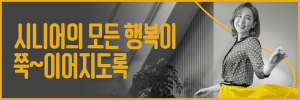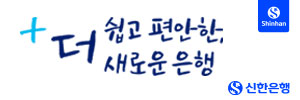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권에서는 핀테크(금융과 IT가 결합한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핀테크에 진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6월 28일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아마존과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AI, 블록체인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핀테크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네이버 사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두 회사의 공통 키워드는 핀테크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지난 3월 취임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해외 진출에 큰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을 내려놓은 후 유럽에만 머물면서 유럽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메신저 ‘라인’을 미국, 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등 해외 진출에 힘쓰고 있다. 유럽 시장 역시 네이버가 노리는 시장이다. 네이버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지난해 9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장관이 설립한 ‘코렐리아 캐피탈’의 첫 번째 펀드 ‘K-펀드 1’에 각각 5000만 유로(약 654억 원), 총 1억 유로(약 1309억 원)를 출자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미국 제록스로부터 프랑스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유럽 진출은 대부분 프랑스에 국한돼 ‘유럽 진출’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다. 네이버는 영국에 진출한 미래에셋대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우리가 가진 AI 등의 기술과 미래에셋대우의 금융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보자는 것”이라며 “아시아권은 문화에 대한 동질성이 있고 경험도 있어 실제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가가고 있지만 유럽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특정 서비스를 통해 진출하기보다 정말로 훌륭한 기술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전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역시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에 11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이 적지 않아 앞으로도 해외 진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금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로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고 있는 현지 법인에 온라인 개인 고객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확충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매매, 중개, 인수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 원이 넘으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종합투자계좌업무도 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인수로 자기자본 규모가 약 6조 7000억 원에서 7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IB 이슈와 네이버 지분 인수는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고 초대형 IB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며 “서로 주식을 갖고 있어서 양사가 같이 잘돼야 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우려되는 점이 없는 건 아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을 비롯한 특수관계자(21.77%), 2대주주는 국민연금(8.61%)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7.11%를 보유하게 돼 3대주주로 올라선다. 미래에셋대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기업 모두 전문 핀테크 기업이 아니다보니 향후 플랫폼 구성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가 가진 미래에셋대우 지분율이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네이버 지분율보다 4배 이상 많아 표면상으로는 네이버의 발언권이 더 세다.
이러한 우려를 염려했는지 양사는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인수한 지분은 엄연히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 또 향후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 각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혹시라도 파트너십이 깨지면 양사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모두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경영권에 흔들림이 올 정도로 리스크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5000억 원의 금액이 오간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이미 작년 12월에 미래에셋대우와 각각 500억 원을 투자해 신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합을 맞춰온 사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