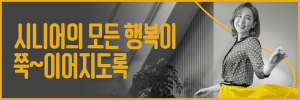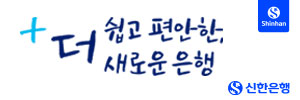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성공을 거둔 안경업계의 총아가 있다. 창립 7년 만에 미국의 안경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워비파커(Warby Parker)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동창생 네 명이 시작한 온라인 안경전문업체다.

온라인 안경전문업체 워비파커. 와튼스쿨 동창생 네 명이 시작한 워비파커는 안경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사진=워비파커
지난 2009년 어느 날, 닐 블루멘탈, 데이브 길보아, 앤드류 헌트, 제프리 레이더 등 네 명의 와튼스쿨 동창생들은 컴퓨터실에 모여앉아 안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경 기술은 800년이 넘었는데, 안경은 왜 아직도 이렇게 비쌀까? 이건 말이 안 돼.”
“왜 안경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의 발단은 길보아가 태국 배낭여행 도중 700달러(약 77만 원)짜리 안경을 분실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학생 형편으로 고가의 안경을 다시 살 수 없었던 길보아는 한 학기를 안경 없이 보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
마침 오래전부터 비영리단체인 ‘비전스프링’을 운영하던 블루멘탈은 사실 안경을 제작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비전스프링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시력검사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안경판매점 창업 교육을 시켜주는 자선단체였다.
얼마 후 블루멘탈은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경 회사를 차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다음 날 밤 술집에 모여 앉은 네 명은 “누가 안경을 온라인에서 사겠느냐”는 주위의 핀잔을 뒤로하고 당장 사업 계약을 맺었다.

워비파커의 핵심 서비스 ‘홈 트라이온’. 안경테 5개를 무료로 받아 써본 후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워비파커
직접 안경을 써볼 수 없는 온라인 스토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구상한 핵심 서비스는 ‘홈 트라이온’ 프로그램이었다. 안경을 구매하기 전에 집에서 안경테를 무료로 써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서비스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 다섯 개를 고르면 선택한 샘플 다섯 개가 집으로 배송된다. 5일 동안 샘플을 써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골라 온라인에서 구매한 다음 샘플을 다시 본사로 보낸다. 이때 왕복 배송료는 모두 무료다.
저렴한 가격은 보기 드문 수직통합형 비즈니스 구조 덕분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디자인, 제조,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워비파커는 안경테를 직접 디자인해 라이선스 비용을 줄였으며, 제조업체로부터 안경을 직접 공급 받고,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안경을 판매했다. 안경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95달러(10만 원)로 같으며, 여기에는 단초점 안경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안경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뿔테의 경우 대부분의 명품 안경 브랜드가 사용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며, 150년 전통의 이탈리아 가족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련된 디자인과 고품질의 안경을 생산한다.
‘대박’ 계기는 <GQ> 인터뷰였다. <GQ>가 워비파커를 ‘안경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른 지 48시간 만에 웹사이트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주문도 폭주했다. 상위 15개 모델은 모두 품절됐고,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서 대기자 명단만 2만 명에 달했다. 이로써 웹사이트 개설 3주 만에 1년 목표 매출액에 도달한 워비파커는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얼떨떨하고 혼란스런 상태이기도 했다.
블루멘탈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주문이 밀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고객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향후 고객 서비스 방침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워비파커는 안경 하나를 팔면 비영리단체를 통해 다른 하나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워비파커
오늘날 워비파커의 고객 서비스는 업계 최고를 자랑한다.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고, 진심이 담겨 있다. 가령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6초 안에 상담원과 연결된다. 이는 사업의 성공 키워드를 ‘고객들의 경험’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회사가 고객들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소문은 창업 초기부터 워비파커의 매출을 이끄는 ‘넘버원’ 동력이었다.
온라인 스토어가 번창하자 점차 ‘사무실로 직접 가서 안경을 써보고 싶다’는 문의도 빗발쳤다. 이런 요구는 결국 오프라인 매장으로 영업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뉴욕 소호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고,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워비파커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또 하나는 이른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바이 어 페어, 기브 어 페어(Buy a Pair, Give a Pair)’ 프로그램이다. 워비파커에서 안경 한 개가 판매될 때마다 비영리단체에 안경 한 개가 기부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부는 워비파커가 영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100만 개가 넘는 안경이 자선단체에 기부됐다. 또 ‘비전스프링’과 함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안경점 창업과 관련된 직업 훈련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다.

창업자 닐 블루멘탈(왼쪽)과 데이브 길보아. 사진=워비파커
워비파커의 브랜드 철학은 무엇보다도 브랜드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6개월 넘게 고민한 끝에 지은 워비파커란 이름은 비트 세대를 주도했던 미국의 소설가 잭 케루악의 소설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워비 페퍼’와 ‘재그 파커’에서 따온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사회적 통념을 깨뜨렸던 케루악의 반항 정신에 감탄한 창업자 네 명은 이런 반항 정신을 자신들의 기업 문화에도 불어넣었다.
현재 워비파커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1조 원)가 넘는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영 전문지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김민주 해외정보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