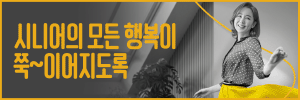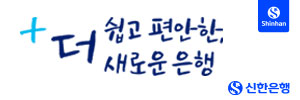그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는 통상임금 판결이다. 연, 혹은 분기별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을 일상적인 임금으로 볼 것인가 사법부는 7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1심 재판을 이달 중에 결론 낼 계획이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노동계가 승소를 자신하는 가운데, 재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등 논리를 앞세워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7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이 곧 나온다. 현재로선 노동조합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사진=일요신문DB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노조에 최대 3조 1000억 원(2015년 12월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 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올해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수의 대기업이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35개 대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통상임금 패소 시 25개 대기업이 8조 36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부담은 하청·재하청 기업으로 확산돼 원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본봉은 높지 않지만 분기마다 상여금을 월급만큼 지급해 급여를 보전해주는 식이다.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500만 원 한도의 복지카드가 지급된다. 기업이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런 상여·복지비는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1988년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 맞춰 노사도 단체협약을 맺고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했다. 현재의 통상임금 규정과 범위는 30년 전 정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란 의미다. 한경연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40.3%가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을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를 꼽았다.
이에 국내 5개 자동차 회사들은 “임금총액과 임금체계는 기업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7월 19일 열린 통상임금 판례법리와 입법방향 국회토론회. 사진=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홈페이지
그러나 본봉 인상률은 낮고 상여·복지비만 늘어나는 급여 구조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퇴직금과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은 본봉에 연동된다. 때문에 본봉 인상 없이 수당만 오르는 급여구조는 인건비 총액 상승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인건비와 관련해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임금 체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인식 변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들도 이런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신의칙’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산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상태는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 판단에 여지를 열어두는 한편 타협점을 제시한 셈이다. 일부 언론에도 관련 자료를 흘려 여론전에 나섰다.
일단 법원도 17일 판결을 한 차례 늦추며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외 자동차 경기 악화와 판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신의칙 원칙 등을 확대 적용하면 기업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임금 규정을 입법화하는 한편 신의칙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상황과 국내외 시장환경, 투자 전망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