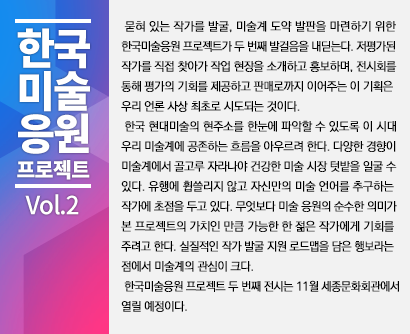
익숙한 현실이 낯설어 보일 때가 있다. 자연이 빚어내는 특이한 풍경이 그렇다. 소나기 지나간 늦여름 저녁 하늘에 노을을 머금어 핏빛으로 물든 뭉게구름. 정월 대보름 언저리 도심 빌딩 숲 사이로 느닷없이 떠오르는 황금색의 커다란 달. 비를 흠뻑 머금은 시커먼 구름을 배경으로 석양 빛 받아 밝게 빛나는 산마을 풍경. 무심코 바라본 한낮의 푸른 하늘에 떠 있는 달.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진부한 일상 속에서 이런 풍경을 만날 때면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예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선함도 이런 것은 아닐까. 지극히 평범한 소재를 새롭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명작의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미술사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명작들의 공통점은 이렇듯 익숙한 현실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화분 4,5,6: 162x79cm, 종이에 연필, 2017년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던 풍경이 기억에 남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드로잉을 계기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당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사소한 일상사 갈피에서 작가가 찾아낸 풍경은 예사롭지 않다. 할머니 손때 묻은 텃밭을 화면 가득 촘촘히 묘사한 풍경인데 현실감이 없다. 늘 있어 왔고, 그래서 습관처럼 스쳐갔던 할머니의 정원이 그에게 특별한 풍경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는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생명의 의미를 깨우쳐 준 계기가 되었다. 생전에 정성으로 키워낸 화초들은 힘찬 생명력을 발산하며 번성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돌보던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보던 텃밭에 사과나무 벚나무 등 갖가지 나무를 심고 정성들여 보살폈다. 곧 나무에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고 그곳은 울창한 숲이 되었다. 숲 한쪽에는 할머니의 나무의자가 자리 잡고 있다.”

아빠의 정원 그리고 여름 2: 116.8x91cm, 종이에 연필, 2016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사의 한 장면이 원지영의 독특한 풍경화로 탄생됐다. 그는 연필로 군집된 식물을 그린다. 형태는 뚜렷하지만 색채가 없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는 연필 선으로만 그린 식물들은 편집광적인 세밀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생명 이미지를 보여주는 색채가 없다. 이렇게 어긋나는 조화가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작가는 이런 회화로 일상 속에 숨은 새로운 모습을 찾아낸 셈이다.
전준엽 화가
| 비즈한국 아트에디터인 전준엽은 개인전 33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400여 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학원>, <일요신문>, <문화일보> 기자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다.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등 저서 4권을 출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