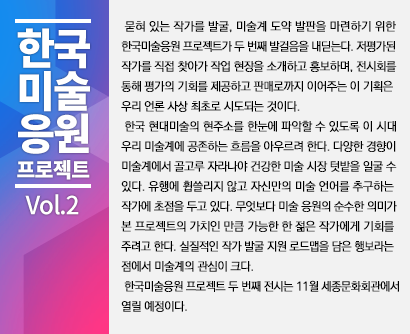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김광석을 기억하고 그 시절 서정에 아릿함을 갖는 세대에게는 아직도 가슴 시리게 하는 ‘혜화동’이란 노래다. 가객으로 불리는 김광석이 동물원 시절에 부른 것이다. 30여 년 전에.
윤정선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런 노래가 떠오른다. 시간의 두께를 비집고 나오는 추억의 서정이다. 잔상으로 남아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의 회화는 자전적 추억이겠지만, 비슷한 연배의 공통적 정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감이 간다. 필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의 부피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홍잔상 72.7x53cm, 캔버스에 유화,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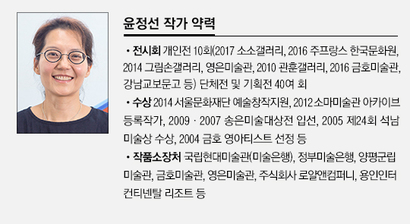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발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왔다. 서구의 인간 편의주의 삶의 양식은 언제부턴가 우리 머릿속에 ‘서구의 삶은 고급스럽고 품위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생각으로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 아파트의 규격화된 편리함은 우리 고유의 정서조차 건조시켜버렸다. 편리함을 얻은 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힘겹게 오르던 언덕길, 먼지 나는 골목, 안마당의 장독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대청마루…. 이런 것에서 묻어나던 서정을 이제는 더 이상 실감할 수가 없다.
윤정선이 자전적 추억 속에서 건져 올리는 이미지에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서정이 보인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동네 풍경을 소재로 한다. 유학 시절 자전적 생활을 읽을 수 있는 건물이나 서울의 오래된 동네풍경이다. 가로등 사이로 아련히 나타나는 골목길도 있고, 거리도 보인다. 장면을 고스란히 그린 것도 있고, 건물만 묘사하고 여백으로 처리한 그림도 있다.

0809 09:17 72.7x60.5cm, 캔버스에 아크릴, 2010년
그런데 특별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의미를 찾아낼 만한 것이 없다.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보통 풍경이다. 그래서 중성적인 느낌이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작가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울림이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공감대 울타리에 들어 있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자연이 사라지고 인공으로 포장된 오늘, 우리 생활에서는 정서마저 가공되는 느낌이 든다. 전자 알갱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속에서는 정서도 정보화되고 있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합을 통해 사랑의 감정까지 조작할 수 있게 돼버린 2017년 여름에 만난 윤정선의 회화가 돋보이는 이유다.
전준엽 화가
| 비즈한국 아트에디터인 전준엽은 개인전 33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400여 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학원>, <일요신문>, <문화일보> 기자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다.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등 저서 4권을 출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