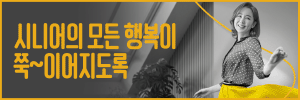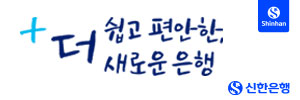지방 금융그룹 중 선두권을 달리는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공식화했다. DGB금융은 지난 1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가 전날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인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구 DGB금융그룹 사옥. 연합뉴스
지난 9월 초 박인규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영진과 함께 입건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5일 박 회장과 대구은행 부장급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50여 명을 동원, 대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회장 등은 2014년 3월 취임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이 코너에 몰리면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당장 대구은행 노조는 박 회장과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도 이미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고 주변에 밝혀왔다. 따라서 후임 회장 논의와 함께 회장·행장 겸임 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도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금융권은 두 가지 해석을 한다. 우선 인수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발을 빼면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은 2008년 CJ그룹에서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될 당시 7500억 원의 몸값을 받았다.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조선업 호황을 등에 업은 현대중공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적 부진에 빠지자 지난해 초 자구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포함됐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희망가격과 시장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매각에 실패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7000억 원 이상의 가격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5000억 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매입 당시보다 가격을 낮췄는데도 2000억 원가량 더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하는 셈이었으니 거래가 성사될 리 없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매각 작업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의 예상 매각가는 올해 들어 급전직하했다. 우선 하이투자증권의 장부가액이 올해 3월 말 7362억 원에서 6월 말에는 4534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이 현대로보틱스 지분 매각대금 중 2828억 원을 하이투자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영향 때문이다.
장부가가 낮아진 만큼 매각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몸값이 낮아지자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들이 러브콜을 보냈다. 사모펀드들은 초대형 IB(투자은행)로 변신하기 위해 몸집을 불려야 하는 증권사들에 하이투자증권을 비싸게 되팔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에 따라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사업다각화를 원했던 DGB도 인수전에 동참했다.
IMM과 DGB금융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듯하던 승부는 지난 8월 IMM이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발을 빼면서 판세가 급변했다. DGB금융이 사실상 단독 인수후보로 남게 됐고, 시간에 쫓기는 현대중공업으로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DGB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DGB가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속도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숨은 경쟁자들의 존재 때문이다. IMM이 손을 턴 지 불과 한 달여 뒤 DGB에서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금융그룹으로 변신을 노리는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등을 앞세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된 것.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DGB로서는 부담스러운 상대인 우리은행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인수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암초는 있다. 우선 인수가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 가격으로 4700억 원 정도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중공업이 이 가격에 만족할지 의문이다.
DGB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들다. 비자금 의혹이 터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 주주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DGB가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재 전문가 등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DGB금융과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박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 결과에 따라 DGB금융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