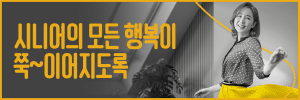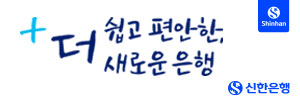요즘 상품 앞에다 ‘시그니처’ ‘리미티드’ ‘북유럽’ 키워드만 붙이면 날개 돋히는 팔려나간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유치원연합회의 한 간부가 입고 나온 셔츠가 화제였다. 네티즌들은 간부가 입은 셔츠를 두고 고가의 ‘톰 브라운’ 제품이라고 추측했다. 그것도 보통 라인이 아니라 63만 원을 호가하는 ‘옥스포드 RWB 셔츠 화이트’의 ‘시그니처’ 라인이란 것이었다. 얼마 후 해당 간부는 직접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셔츠는 4만 원 짜리 시장표’라고 결백을 주장했고, 다행히 누명에서 벗어났다.
사건은 허무하게 일단락됐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제품으로 옮겨갔다. “그냥 제품도 아니고, 시그니처 라인이래” “역시 시그니처 라인이라 고급지네” “시그니처 라인이라 가격도 비싸네” 등 셔츠 앞에 붙은 ‘시그니처’ 키워드에 주목했다. 앞서 간부의 누명과 별개로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마케팅은 대성공인 셈이었다.
요즘 ‘시그니처’ 키워드는 품목을 안 가리고 여기저기 마케팅으로 이용되고 있다. 앞서의 패션업계는 물론이고 뷰티와 가전제품, 유아용품과 심지어 햄버거까지 각양각색이다. 맥도날드는 ‘수제버거’와 가깝게 패티를 비롯한 내용물의 퀄리티를 높인 ‘프리미엄 라인’을 ‘시그니처 버거’로 명명하며 대중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선 시그니처로 명명된 양문형 냉장고가 날개돋인 듯 팔려 나간다. 물론 값은 곱절이나 비싸다.
‘시그니처(Signature)’는 본디 업을 이룬 명인 혹은 장인의 서명이 새겨진 보증된 작품 혹은 상품을 의미했다. 하지만 최근엔 그 의미가 ‘다른 상품과 다르게 특별히 공을 들여 만든 상품’ 혹은 그러한 성격의 ‘프리미엄 상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의 확대와 더불어 남발 현상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시그니처’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받기도 한다.
장문정 MJ소비자연구소 소장은 “시그니처는 소비자로 하여금 독특한, 차별화된, 소유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혹은 각별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구매욕을 자극한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물리적·기술적 과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 같은 시그니처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과도한 남발은 먹히지 않는다”라며 “일반인의 사인(Signature)과 유명인의 사인(Autograph)은 분명 다르다. 도리어 아무 상품에나 시그니처라고 명명하는 건 코웃음만 나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비슷한 게 ‘리미티드’ 마케팅이다. 기존 라인과 맥을 같이하며, 이벤트 성격으로 생산량을 한정한 특별 상품을 내놓는 경우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포츠 브랜드다. 나이키의 에어나 아디다스의 이지부스트 같은 대표 라인은 곧잘 세계 한정판 모델을 내놓곤 한다.
이 때문에 마니아들은 한정판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 계정까지 이용해가며, 온라인몰에 응모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긴 줄을 서기도 한다. 한정판 모델을 되파는 2차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다. 최근에도 아이다스의 ‘이지부스트 350V2’ 모델 확보를 위한 팬들의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국내 대표 필기구업체 모나미의 경우, 금장과 은장 제품을 한정판으로 내놓으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애초 골수 소비층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목적으로 활용되던 ‘리미티드’ 마케팅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다. 최근 한 어패럴 업체는 특정 뮤지션의 얼굴이 프린팅 된 아우터를 한정판으로 내놓았고, 완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완판’에 맛을 들여 한정판이란 말이 무색하게 다시 비슷한 제품을 찍어내 팔았고, 뮤지션 팬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말 뿐인 한정판이었다.
앞서의 장 소장은 “사실 한정판 마케팅은 따지고 보면 오래된 마케팅이다. ‘마지막 조건’이라고 외쳐대던 홈쇼핑이 대표적”이라며 “리미티드 마케팅은 사실 지속가능한 마케팅이 아니다. 과도한 프로모션은 오히려 마케팅을 저해한다. 한정판이란 말이 무색하게 계속 찍어내는 건 경제 논리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선 제 살 깎아먹는 행동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안 속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같은 프리미엄 마케팅 중에서 돋보이는 키워드가 ‘북유럽’이다. 주로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에서 각광 받던 이른바 ‘북유럽’ 마케팅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 적당히 살자는 소확행, 더하기 보단 덜어내자는 미니멀리즘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담은 이른바 ‘북유럽 마케팅’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마케팅은 부동산 분양시장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최근 ‘북유럽 감성’ 혹은 ‘북유럽풍’을 강조한 아파트나 상가 분양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북유럽 인테리어에 익숙한 3040세대가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으로 성장하면서 부동산에도 자연스럽게 북유럽 마케팅이 각광을 받는 중”이라며 “고양시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남양주의 ‘두산 알프하임’, 김포와 파주 단독주택 ‘라피아노’ 등이 북유럽 감성을 덧입히면서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 팀장은 “과거에는 소유를 통해 과시하려는 경향이 컸다면 이제는 자연과 주변의 조화로움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