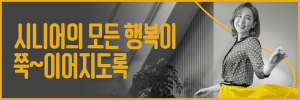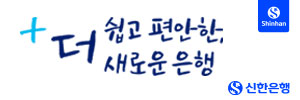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만큼, 그 가격이 크게 오르면 ‘내가 내야할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거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마디로 과장된 우려라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시지가는 쉽게 말해 정부가 매겨 공시한 땅값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가치를 평가하고 공시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신뢰도 높은 표준 지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도입됐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3309만 필지 가운데 주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개 필지(2018년 기준)를 표준지로 선정해 ㎡당 가격을 매긴다. 단독주택은 22만 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아파트는 1300만 호를 전수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가 조사한 개별토지들을 앞서의 표준지공시지가와 특성을 비교해 매긴 ㎡당 가격이다. 흔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말하는 공시지가가 바로 이 개별공시지가다. 실제 세금을 매기는데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문제는 공시지가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공시지가 논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실거래가는 보통 입지와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에 미래 가치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과 땅값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정부도 그동안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오르도록 조정해 왔다. 2018년 기준 표준지가 상승률은 2017년과 비교해 6%,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집값과 땅값이 빠르게 오른 서울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특히 가격이 폭등한 고가 단독주택이나 토지일수록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국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되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9130만 원으로 고지됐지만 시장 가격은 약 3억 원이다. 2014년 현대자동차는 삼성동 한전부지를 약 10조 원에 샀지만, 공시지가는 2019년 현재도 2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슷한 단독주택들끼리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4억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였다. 시세반영률은 25%다. 반면 강북구 미아동의 다른 단독주택은 1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시지가는 1억 4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였다.
이처럼 공시지가의 실제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게는 25%에 불과하고, 평균 50~55%에 머물러 있자 정부는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실거래가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긴다는 걸 고려하면, 가격이 짧은 시간에 급등했거나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정 중인 표준주택 공시지가 관련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고, 이를 반영해 오는 1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의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처럼 시세반영률이 낮은 고가 주택이 첫 타깃이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의견 청취를 마무리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마포, 용산 등)의 일부 고가 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200%(3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30일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시세 반영률이 약 80%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유세 폭탄’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진=최준필 기자
# 집값별 세금 인상 격차 뚜렷 “폭탄 아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보유세)를 더 내게 된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를 인상하기로 한데다, 공시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의 ‘세금폭단’이나 ‘징벌적 과세’ 등의 주장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뜯어보면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나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을 제외하면 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사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강북에 위치한 주택에 각각 공시가격 80%를 적용해 보면, 가격이 비싸고 오름세도 가팔랐던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200만 원가량 오른다. 반면 비슷한 면적이지만 가격은 싼 강북의 다른 주택은 보유세가 약 8만 원 가량 오른다”며 “가격별로 세금 인상 격차가 뚜렷하다. 여기에 강남구의 경우 최근 수년 사이 집값이 오르면서 나온 수 억 원의 차익과 실제 집값을 보유세 인상폭과 고려해 보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한이 설정돼 있다. 공시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세액의 1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만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 증가 상한도 각각 200%~300%로 높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투기를 꼽고 있다. 집이 비싸고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기세력이 시장에 들어올 요인이 사라진다. 정부가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통해 ‘실거주용으로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재차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서민층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약 2~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는 “실제 보험료를 3~6만 원가량이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아닐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세금 관련 방향은 유지하면서, 세율을 더 세분화하거나 저가 주택의 부담을 더 낮춰주는 등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