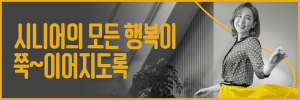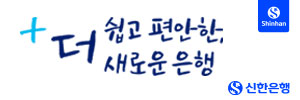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국내 1호 초대형 IB(투자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웅진코웨이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여유자금이 불과 1000억 원 남짓이던 웅진그룹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며 인수를 독려했다가 ‘승자의 저주’에 빠진 웅진그룹이 자금난에 허덕이자 재매각 주관사로 다시 나섰기 때문이다.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웅진그룹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한투증권은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며 표정관리를 해야 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건물 전경. 박은숙 기자
한투증권은 인수 주체로 나선 웅진씽크빅에도 별도의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웅진씽크빅이 전환사채(CB)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이 CB를 한투증권이 전량 매입하는 방식이다. CB는 발행 직후 1년간은 1%, 2년차부터 2%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CB 역시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잡았다.
한투증권은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LOC)를 웅진그룹에 보냈고, 이 LOC는 증권가와 재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웅진그룹 자금조달 능력과 관련한 물음표를 단번에 해소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물론 한투증권에도 남는 장사였다. 연 500억 원이 넘는 대출과 CB 이자와 별개로 LOC를 제공한 대가로만 1%의 수수료를 챙겼다. 웅진코웨이 M&A가 성사되면 160억 원을 앉아서 버는 셈이었다.
한투증권을 등에 업은 웅진그룹은 계획대로 웅진코웨이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수가 끝나자마자 그룹 지주사인 ㈜웅진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웅진코웨이 때문에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불과 석 달여 만에 우려는 현실이 됐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토해내기로 결정하고 재매각에 나섰다. 머뭇거리다 파국을 맞느니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각 주관사를 한투증권이 맡기로 했다는 점이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대며 인수를 도왔던 회사를 몇 달 만에 다시 되파는 작업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기업금융 분야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투증권에는 처음부터 꽃놀이패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1000억 원밖에 없는 회사가 2조 원 규모의 M&A를 하겠다는데 돈을 댈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투증권이 과감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출구전략까지 감안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한투증권의 ‘큰 그림’은 이렇다. 웅진코웨이 지분 1조 7000억 원어치를 담보로 잡고, 담보가치의 60%가량인 1조 1000억 원을 대출해준다. 인수 후 웅진코웨이가 잘 굴러가면 수수료 120억 원과 매년 이자 500억 원을 챙긴다. 만약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웅진코웨이를 접수하거나 헐값에 팔아도 본전은 건진다. 웅진씽크빅 CB 역시 마찬가지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웅진씽크빅도 접수할 수 있다. 한투증권 입장에서 웅진코웨이 인수금융은 처음부터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이었던 셈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결국 웅진그룹은 연간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석 달여 만에 웅진코웨이를 잃었다. 반면 한투증권은 ‘복합 IB 솔루션’을 제공한 대가로 투자확약서 발급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벌어들였다. 게다가 한투증권은 M&A 진행 과정에서 차입금을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전량 재판매(셀다운)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을 당혹케 하고 있다. 대출해준 돈을 떼일 위험을 다른 금융사들에 넘기고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웅진코웨이 재매각 주관사로 나서자 금융권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다른 금융사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투증권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다만 재매각 주관사까지 또 맡는다는 것은 같은 금융권에 몸담은 입장에서 입맛이 쓰다”고 말했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