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명시된 문장이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도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최고 운영 원리다. 그 정신인 공화주의를 부단히 추구해야하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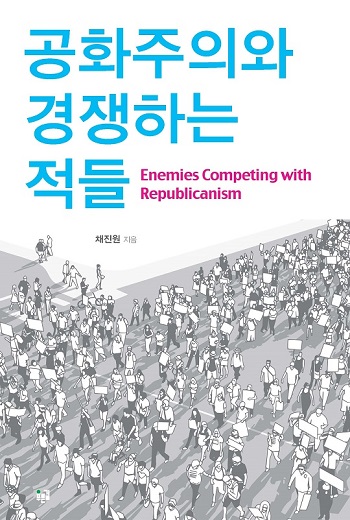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펴낸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표지. 사진=푸른길 제공
앞서 언급했듯 민주공화국 역사는 100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성숙한 공화단계인지는 의문이다. 채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인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보다 앞서 두 번의 쿠데타(1961년 5․16, 1980년 12․12)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론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갑질’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안티페미’ ‘일베’ ‘워마드’ 등 왜곡된 성대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3조를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정치적으로도 정당 지도자들은 낡은 패러다임에 기초해 분열적, 당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바탕엔 정치적 양극화를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진영논리가 있다.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지금부터 독립운동을 하자는 사람, 1987년 독재가 끝났는데 지금부터 반독재운동을 하자는 사람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론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상생활의 공간인 가정 직장 사회 공직 등에서 공화주의를 지키고 구현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2018년 급진전된 남북미 관계의 변화 속에서 나온 복잡함의 증대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은 일제강점기, 독재시대, 반공시대에나 가능했던 친일 대 반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과 경쟁의 상대인 경쟁자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방의 해법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채 교수는 대한민국이 왜 민주국(democracy)이 아닌, 민주공화국(republic)인지를 생각해보고 토론하기를 제안했다. 둘의 뜻이 다르다면, 그 차이점을 밝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대로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국은 다수파에 의한 소수파 지배를 인정한다. 이는 다수파의 전횡에 따른 소수파 무시, 우중정치, 포퓰리즘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채 교수는 민주공화국이 이런 민주국의 단점을 보안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수파와 소수파를 섞되, 전혀 다른 제3의 방식으로 혼합해 비지배적 자유를 추구하는 체제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