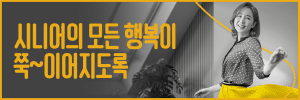여의도 증권사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생상품은 보통 차입을 일으켜 투자하는데, 이때 차입 원금이 증거금이다. 자산가격 하락으로 증거금을 모두 까먹게 되면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충을 요구하는데 이를 마진콜이라고 한다.
3월 중순 글로벌 증시 대폭락 당시 조 단위 마진콜이 접수됐고, 대형 증권사들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내다팔아야 했다. 심지어 보유 기업어음(CP)을 내다팔거나 자체 CP 발행으로 자금을 긁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CP 가격까지 하락(금리 상승)해 일반 기업들의 자금 유통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원화 자산을 매각해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 당국의 도움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EL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각광받는 금융상품이었다. 증권사에서는 ELS로 은행에서는 ELF 형태로 판매됐다. 통상 투자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데, 현재 발행 잔액이 약 50조 원에 달한다. 기초자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조기상환돼서 다시 설정되는데 이때마다 판매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자체 헤지까지 수행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더욱 커진다. 증권사들이 돈벌이에만 집중하며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처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비율로 외화자산을 준비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은 해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ELS를 만들 때 달러 확보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익률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유동성 관리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면 증권사들의 자산 투매가 재현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