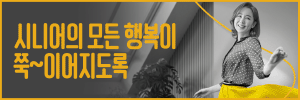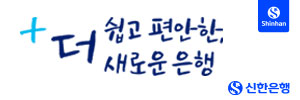우리금융은 원래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우량 증권사를 거느린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2002년 7월 한빛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해 우리증권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2004년 LG카드 사태 여파로 LG그룹에서 분리된 LG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우리투자증권이 탄생했다.
업계 빅3 중 하나였던 LG증권이 합류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은 증권업계에서도 강자로 군림했다. 신용평가 등급이 업계 1위인 삼성증권과 더불어 ‘AA+’로 가장 높을 정도였다. 특히 삼성에도 밀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IB(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증권업계 선두 다툼을 벌였다.

서울 중구 소공로 51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 정부는 우리금융을 지방은행, 증권패키지, 우리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분리 매각키로 했다. 이듬해 우리투자증권은 농협금융그룹에 매각되면서 NH농협증권과 합병해 지금의 NH투자증권이 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증권업에서 손을 뗀 우리금융이 다시 증권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부터다. 우리은행 중심으로 은행업에 집중하던 우리금융이 지주사로 탈바꿈하면서 다양한 사업군을 거느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우선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을 인수하며 지주사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금융은 은행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불과하다. 신한(34%)·KB(30.8%)·하나(21.9%)금융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금융은 증권이나 보험사 등 어느 정도 규모와 수익성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대형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이 매물로 나오자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금융권은 비록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푸르덴셜 매각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몸집 불리기 의지만큼은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마침 최근 증권업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여파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뜻밖의 기회가 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부 증권사들은 단기채권 물량을 쏟아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긴급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에 증권사 매물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이름이 거론되는 증권사들은 모두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접촉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당사자가 당장은 팔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금융이 과감한 베팅에 나설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접촉설이 나오는 증권사들의 면면은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우선 삼성증권이 거론됐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50조 원이 넘는 ‘톱5’ 증권사다. 십수 년 전까지는 증권업계 1위를 달리는 업계 대표선수였다. 삼성증권의 이런 입지를 고려하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우리금융이 가장 탐낼 만한 증권사로 꼽힌다. 사진=이종현 기자
과거 삼성증권과 어깨를 겨뤘던 우리투자증권의 위상을 기억하는 우리금융에게는 삼성증권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탐낼 만한 증권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재벌그룹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분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우리금융이 삼성증권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삼성증권 측은 “매각은 검토해본 적조차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삼성증권보다는 작지만 업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교보증권도 다시 거론된다. 교보증권은 이미 2018년 우리은행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교보증권의 최대주주인 교보생명과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간접 인수 방식으로 교보증권 인수를 협상 중이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돌았다. 당시 양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했지만 투자금을 돌려주는 문제를 놓고 재무적 투자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동안 매각설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만계인 유안타증권의 이름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금융에 매각될 것이란 얘기가 한차례 돌았던 유안타증권은 우리금융이 계속 미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은 전통적으로 IB 강자였다. IB뿐만 아니라 리테일 부문도 대형사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 아울러 종금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우리종금과 합병할 경우 시너지도 기대된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증권사 11위에 랭크돼 있으며 순이익은 778억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교보증권보다 더 크다. 다만 대만 유안타그룹에서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경영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매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반면 매각을 원하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오히려 우리금융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증권업계가 초대형 IB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형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정리하려는 회사들이 주인공들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당장은 대형사 위주로 매물을 찾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복수의 중소형사를 인수해 합병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사를 인수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에 맞는 매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과거 LG증권을 인수할 당시처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만큼 시간을 갖고 다양한 증권사들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