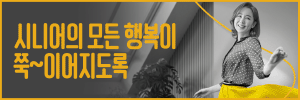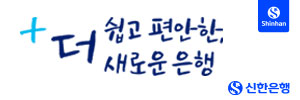조 바이든 대선 캠프의 최대 기부처는 빅테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황판. 사진=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모금 현황을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선자인 조 바이든 캠프가 5대 빅테크 직원들로부터 최소 1510만 달러(약 168억 원)를 모금한 점이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때 민주당 캠프의 최대 기부처는 로펌인 모건&모건, JP모건체이스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그 뒤를 이었다. 버락 오바마 때도 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 함께 딜로이트, 타임워너, AT&T 로펌 DLA파이퍼가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위 5개사를 빅테크가 싹쓸이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기부액은 526만 달러로 압도적 1위다. 클린턴 때도 1위였고, 오마마 캠프 때는 2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21만 달러, 아마존은 281만 달러로 2, 3위를 차지했다. 아마존은 이전 대선까지는 민주당 캠프에 대규모 기부가 없었다. 이어 애플 197만 달러, 페이스북 185만 달러의 순이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등 미국 5대 은행 직원들은 370만 달러를 기부했다.
도널트 트럼프 캠프에는 아메리칸에어라인, 보잉, 뱅크오브아메리카, 록히드마틴, 웰스파고 등이 주요 기부자였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진보편향 여론을 조장하는 데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치 기부는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조사에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이 트럼프의 거짓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옹호해왔고, 집권 후 미 행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에 큰 기여를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강도 높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이익단체와 로펌 등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일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기업이 직접 정치인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직원을 통하면 제한이 없다. 2020년 대선부터는 온라인 방식의 기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달러 이상의 기부는 소속 회사를 밝혀야 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