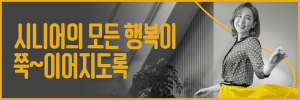삼성의 대규모 상속세와 관련해 세율 조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낡은 제도의 틀이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들이 참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20년간(2000~2019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6.9배 증가하고, 신고세액도 7.1배 급증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와 기업 현실에 맞는 상속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수십 년간 과표구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상속세는 ‘부자세’라는 정서 때문에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손을 못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과표구간 가운데 30억 원 이상 상속자산에는 최고 세율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체계가 정립된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자산이 30억 원이 넘는 기업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규모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 방지가 상속세 취지인데 지금은 그 취지가 흐려져, 많은 중산층이 포함되고 마치 재산을 뺏기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주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지금은 공제나 증여 등등 세제 내적 외적 요소로 중산층이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지속해 중산층 일부도 상속세 내는 것이 맞는지 좀 더 부유한 쪽으로 대상을 잡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무법인다솔WM센터 소속 최용준 세무사도 “자산이 많은 7080세대의 상속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기에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달랑 아파트 하나가 자산인데 상속세로 1억 원을 넘게 낸다면 억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계층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를 한 번에 바꾸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요구에 따라 현행 상속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3분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