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짜르트와 거닐다-1: 175.5×145cm 캔버스 한지에 수묵 color 2019
케니지가 연주하는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 노을빛에 물든 도심이 눈앞에 그려진다. 빌리 조엘의 ‘스트레인저’ 서두에 흐르는 휘파람 소리는 인적 끊긴 자정 인공조명의 애수 찬 도심 거리가, 리 오스카가 들려주는 하모니카 음색에서는 남프랑스의 따뜻한 시골길이 아른거린다.
그런가 하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으면 남부 독일의 시골 풍경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에서는 낮은 구름 아래 펼쳐진 북유럽의 산들이 보인다. 우리 음악인 이생강의 대금 산조에서는 달빛 부서지는 강물이, 황병기의 가야금 소리는 봄날 눈 맞은 연분홍색 매화가 보인다.
소리를 들을 뿐인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눈앞에 그릴 수 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두 구체적이고, 솜씨 좋은 사람이라면 그려낼 수도 있다. 소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초춘우후(初春雨後): 84×96.5cm 한지에 수묵 colo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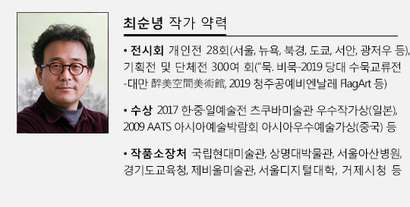
음 자체는 구체적 이미지를 묘사하지 못한다. 태생 자체가 추상인 소리로 음악가들은 어떻게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음을 배열하고 조합해내는 기술로 가능해진다. 이를 작곡이라고 하는데 구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예술이다.
음악의 이런 힘에 관심을 갖고 그림으로 번역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19세기 말, 회화에다 음악적 구성 방식을 이용해 처음으로 소리를 그리려 했던 이는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다. 그는 회화의 선, 형태, 색채가 음악에서 음과 같다고 생각해 작곡가가 음을 구성하듯이 화면 속에서 이런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할 것인지를 그림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한 화가는 서양미술에서 처음으로 추상화를 그렸다고 알려진 바실리 칸딘스키다. 그는 색채와 형태를 조합하여 교향곡 같은 예술적 감흥을 자아내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칸딘스키는 음악이론을 회화에 도입하는 방법을 실험했다. 즉 색조는 음색으로, 색상은 음의 높낮이 그리고 채도를 음량으로 비유해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그의 추상화다. 그러나 이런 그림을 보고 실제로 음악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새벽을 거닐다 2018-4: 200×120cm 한지에 수묵 mix media color 2018
한국화가 최순녕도 이런 고민 속에서 자신의 회화를 찾아가는 작가다. 수묵의 번짐 효과와 거친 붓에 의한 먹의 우연성을 이용해 음악의 느낌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작업을 보면 숲의 이미지가 화면 전체에 깔리고, 그 위로 음표가 배열돼 있다. 그가 그린 악보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의 일부다. 실제로 이런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는데, 음악의 감흥을 몸으로 담아 즉흥적으로 선이나 색채로 단번에 화면에 옮기는 작업이다.
그는 숲에서 체감한 청량하고 안정되는 느낌과 클래식 절대 음악의 순수성의 공통된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다.
| 비즈한국 아트에디터인 전준엽은 개인전 33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400여 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학원>, <일요신문>, <문화일보> 기자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다.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등 저서 4권을 출간했다. |
전준엽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