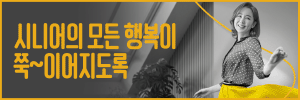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
||
최씨나 김씨처럼 지역 유선·케이블TV사에서 제공하는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채널 번호=특정방송사’란 등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방송의 최종 전달자인 각 지역 유선·케이블 사업자들 손에 채널 번호 배정권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최씨와 김씨가 사는 지역의 케이블 사업자가 SBS 방송을 채널 6번이 아닌 5번을 통해, MBC 방송을 채널 11번이 아닌 12번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70% 정도에 육박하는 1천1백만여 가구가 TV안테나를 직접 설치해 공중파TV를 시청하는 대신 각 지역 케이블 TV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방송을 접하고 있다. 즉, ‘채널6-SBS, 채널7-KBS2, 채널9-KBS1, 채널11-MBC’의 절대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대신 공중파 방송의 전유물이던 11번 이하의 번호대에선 홈쇼핑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각 지역 유선·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임의대로 채널을 정해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것은 유료방송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케이블TV방송사(SO)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대한 ‘특별 후원(금품)’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방송사가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와서 방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룰이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업계에선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SO는 시스템 오퍼레이터(System Operator)의 약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서울지역의 강남 케이블TV, 강서 케이블TV 같은 사업자를 뜻한다. PP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 다시 말해서 스포츠전문채널, 바둑채널, 음악전문채널, 다큐멘터리전문채널 같은 사업자들이 이에 속한다.
지난 93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각 지역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주요 공급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사와 방영을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은 역전됐다. SO는 70여 개로 한정돼 있는 반면 PP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백50여 개에 이른 것이다. 결국 시청자들에게 낯익은 공중파 채널 번호 근방의 번호대가 명당 자리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차지하기 위해 PP들 간의 과잉경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각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에 뒷돈을 가져다주면서 채널을 구걸하는 식이 된 것이다.
케이블TV업계에 종사하는 신아무개씨(32)는 최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이렇게 꼬집는다. “A라는 음악전문 프로그램 사업자가 있다고 치자. A사에서 가요순위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도 자체 방송채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케이블방송사에 이 프로그램들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A사는 케이블방송사에 찾아가 프로그램 기획안과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방송사측은 돈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 액수에 따라 A사 프로그램이 송출될 채널이 정해지는 것이다.”
즉, A사가 방송사에 돈을 많이 주면 시청자가 기억하기 쉽거나 선호하는 채널을 배정받게 되고, A사가 돈을 적게 주면 70~80번에 가까운 채널을 배정받거나 아예 채널 배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 케이블방송사는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채널 배정을 교체한다. 즉, 30번 채널에서 방영되던 어느 스포츠전문방송이 하루 아침에 73번으로 갈 수도 있으며 73번에서 방영되던 영화전문채널이 갑가지 30번 채널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공급자가 방송사에 건네는 액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일례로 SBS스포츠채널을 들 수 있다. 이 채널은 ‘SBS스포츠30’이란 채널명을 갖고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30’을 뺀 ‘SBS스포츠’란 이름만을 쓰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래 30번 채널을 통해 송출했는데 각 지역 케이블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송출 채널이 달라지면서 ‘30’이란 숫자를 빼버렸다”고 밝힌다. 앞서 거론한 최씨의 경우 얼마 전까지 채널 30번에서 SBS스포츠를 시청했지만 이젠 73번을 통해 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젠 공중파 방송의 번호 마케팅은 진작에 휴지가 됐다. 예를 들어 서울 어느 지역에 가면 MBC가 10번에서 나오기도 하며 어느 지역에선 SBS가 5번에서 나오기도 한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선 직접 TV안테나를 세워 방송 주파수를 잡아내기보다는 각 지역 케이블방송사나 SO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 사업자가 전달하는 여러 채널을 접하고 있다. 즉, 각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채널이 마구 바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케이블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공급자들이 2번에서 11번 사이의 채널을 가장 선호한다. 프로그램이 11번 안쪽 채널을 타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방송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공급업체가 방송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시세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경기도 일대 케이블방송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채널 확보하는 데 보통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기도 한다. 공중파 채널인 6·7·9·11번 등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1천만원 이상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11번 이내 주요 채널들은 자금동원 능력이 강한 홈쇼핑 업체들이 모두 차지한 상태다.
하지만 모든 홈쇼핑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 업체들은 50번대로 밀려나있기도 하다. 때문에 각 홈쇼핑업체들은 SO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을 공유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등 치열한 번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래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팔아야할 공급업체들이 뒷돈까지 줘가며 채널 확보 전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심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홈쇼핑과 유사한 광고프로그램(인포머셜)을 삽입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한 케이블 업자의 설명. “B라는 프로그램공급업체가 서울 어느 특정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채널 8번을 배정받았다고 치자. B사는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방송사에 지불했을 것이다. 반면 B사는 C라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B사 방송 말미에 C사에서 제작한 광고방송을 내보낸다. 웬만한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한 드라마나 스포츠중계가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광고방송 화면이 뜨면서 ‘지금 전화주십시오’와 같은 멘트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각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자기 구미에 맞게 채널을 넣고 빼고 번호대를 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돈 주고 시청한다는 ‘유료방송’의 기본 개념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