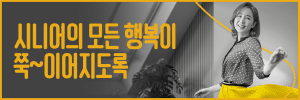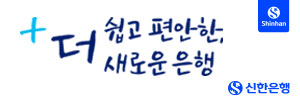하지만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공간인 주거환경이 최상급은 아닐 수 있다. 가령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도곡동 아파트는 교육환경이 좋아 가격이 비싸지만 교통이나 편의시설 환경은 아주 좋은 곳이 아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역시 값은 비싸지만 지은 지 40년이 넘어 살기에 불편하다. A 아파트 소유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비싼 집은 주거환경도 우수할 것으로 지레짐작할 것이다. 이 같은 사고는 아파트값으로 삶의 환경을 저울질하는 편향에서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 가격에 모든 아파트의 쓸모와 효용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주거공간에 대한 자본주의적 인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는 주택의 가치를 쉽게 수치화·계량화할 수 있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는 쉽게 가격으로 변환된다. 아파트 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원하는 데 익숙하다. 집을 공간적 의미보다 숫자로 추상화한 대상으로 대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디 사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사는 동네만 말해도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안다. 아파트 가격은 그 사람의 사회적 출세와 부의 축척 정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이제는 저울에 올려진 정육점의 고기처럼 아파트 가격에 따라 삶이 평가되는 꼴이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부자는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보다 10배 이상 행복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가격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최상의 목표가 된다. 아파트라는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파는 아파트 가격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중심적 사고는 아파트 가격으로 삶을 서열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 이러다보니 행복도 가격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한다. 싼 아파트에 살면 나는 인생에서 루저(실패자)로 전락한 듯한 자괴감이 밀려온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순간 가격 우상향의 기우제를 지낸다. 아파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니 가격 흐름에 온통 신경이 쓰인다.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모든 걸 잃은 듯 밤잠을 못 이루고 하루 종일 좌불안석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현대판 기복신앙인 ‘아파트교(敎)’를 떠올린다. 아파트교는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그 가격을 신봉하는 것이다. 아파트교는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세속화된 종교가 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파트교의 독실한 신도가 되어버린 느낌이 드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우리가 믿는 아파트교는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경제TV의 ‘올해의 부동산 전문가 대상’(2007), 한경닷컴의 ‘올해의 칼럼리스트’(2011)를 수상했다. 현재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미래쇼크’,‘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등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