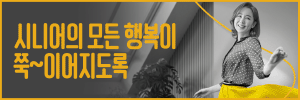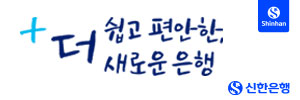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 ||
| ▲ 통신시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있는 것과 관련하여 두 라이벌 통신사 CEO가 잇달아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이석채 KT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에서 “2009년 아이폰 도입과 함께 데이터통신 요금을 88% 낮춘 것이 결과적으로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데이터요금을 너무 한꺼번에 확 내렸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가 반감됐고 ‘보이스톡’ 같은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속출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단계적으로 내렸다면 통신사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
이날 이 회장의 발언은 통신사들의 영업·외부환경이 고달프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데이터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이 회장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아이폰 도입이 과연 크게 성공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폰 도입은 이 회장의 가장 큰 치적으로 꼽힌다. 아이폰 도입으로 국내 통신시장의 환경과 판도를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아이폰 도입이 이석채 회장이 올해 초 KT 회장에 연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이 회장이 KT 회장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아이폰 도입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폰 도입은 KT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회장이 KT 수장으로 부임한 첫해인 2009년 KT 매출액은 19조 6491억 원에 영업이익은 9665억 원, 당기순이익은 6097억 원이었다.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후 이듬해인 2010년 KT는 매출액 20조 3262억 원에 영업이익 2조 787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148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조 단위를 기록한 2010년은 이 회장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해다. 아이폰 효과를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또 하나의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82라운드를 거친 끝에 포기, 주파수를 SK텔레콤에 내주면서 LTE 경쟁에도 늦게 뛰어들었다. 당시 KT 내부에서도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했다.
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요금을 단계적으로 내렸다면 아마 고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비싼 데이터요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스마트폰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훨씬 비싸졌다는 불만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탓을 과거의 판단 착오로 돌릴 게 아니라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채 회장은 또 최근 잇단 문제성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침범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불러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취임 후 행한 사내개혁과 구조조정 등이 노사화합 덕분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KT는 오너가 없는 기업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총수가 있는 재벌과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과 소유지분도에 잘 나타나 있다. KT의 계열사는 2008년 29개에서 올해에는 50개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부동산업, 자동차리스업 등 주력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고 있다.
이 회장은 KT의 노사화합을 자랑으로 삼지만 한편에서는 이 회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KT새노조와 KT공대위(죽음의기업KT·계열사 노동인권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8일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이석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석채 회장의 라이벌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용화하자”는 화두를 던져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주파수를 공용화하면 주파수 사용권을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그만큼 통신요금도 인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제안을 접한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경쟁업체들이 고개를 젓고 있다.
한 경쟁업체 관계자는 “주파수가 곧 경쟁력인데 그것을 공유하자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주파수를 공용하면 통신사 특유의 장점과 경쟁력이 사라진다. 특히 품질을 앞세운 업체의 경우 오히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통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나 경쟁업체나 아직 반응은 냉담하지만 조만간 이론을 정리해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상철 부회장의 제안을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방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LG유플러스의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2조 5397억 원, 영업이익 68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4%나 하락했다. 지난해 6월 황금주파수로 불린 2.1㎓을 대역을 거머쥐고 ‘LTE 바람’을 일으키면서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1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로 평가받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망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경쟁업체들의 추격이 맹렬해지면서 ‘LTE 바람’도 지난해보다 시들해진 상황이다. LTE의 비싼 요금체계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 LTE에 기대를 잔뜩 걸었던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고, 이것이 이 부회장의 ‘주파수 공용화’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과 달리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의 표정은 비교적 여유로워 보인다.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SK하이닉스에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동통신 부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