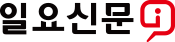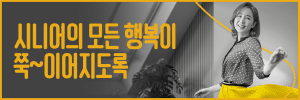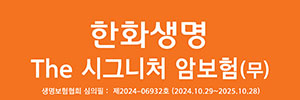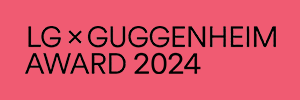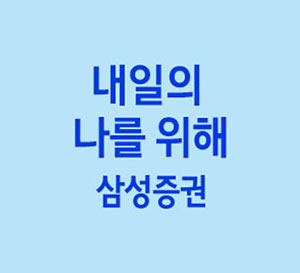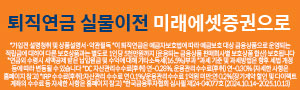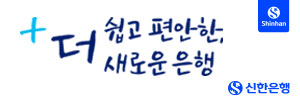우리나라의 누적 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1.80GW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설비용량의 0.01% 수준이다. 2018년부터 신규 사업 단지 수는 10개소 미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8년 8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6개소,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뿐이었다. 누적 풍력 단지 수는 115개소다.
우리나라 풍력 사업 발전 속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GWEC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설비용량만 6만 3249MW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 3496MW, 대만 1284MW, 일본 444MW 순이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년 동안 158.4MW만 신규 설치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풍력 사업 보급 속도는 더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2017년 12.80GW에서 2021년 30.21GW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사업은 5.83GW에서 21.19GW로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풍력은 1.14GW에서 1.71GW밖에 늘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뒤를 이어 원전(23.9%), 석탄(21.8%), LNG(19.5%), 무탄소(3.6%), 기타(1.0%)로 전원 구성을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세부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는 원전(32.4%)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전기본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신규 원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전력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당장 태양광 발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형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 폐지를 선언하면서 보급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혁신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 등을 전면 재점검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 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했고, 대검찰청에 3828건(901명)을 수사 의뢰했다. 위법 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약 308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손은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원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풍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 풍력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