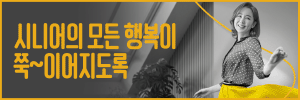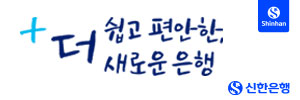10년 뒤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연준은 2004년 5월 1%이던 기준금리를 2006년 7월까지 5.25%로 끌어올린다. 인터넷 거품 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펼쳤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을 부풀리며 물가가 오르자 연준이 나선 것이다. 1995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긴축을 호황의 증거로 받아들였고 증시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다. 하지만 미국도 고금리 여파로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연계된 집값 거품이 붕괴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야 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0월 3일 4.8%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미 5%를 넘었고, 30년물도 5% 턱밑이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다.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겨져 가장 많이 거래됐던 미국 장기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다.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에 장기국채를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매에 나선 것이 원인이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일단 팔아 손실을 제한하고 현금을 만든 후 더 높은 금리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장기 국채를 판 현금은 연 5%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단기국채로 몰리고 있다. 주요국 단기국채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비 달러 통화의 가치하락이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외국 자본은 환 손실을 피해 이탈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화폐가치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꼭 그렇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10월 4일 1360원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4일 한때 4.3%를 넘어섰다. 현재의 금리와 환율은 모두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는 전조가 있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미국의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가치가 높아지며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임금까지 오르며 소비 자체도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다. 미국처럼 소득이 늘지도 않는데 금리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고물가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모습이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긴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연준이 (긴축을) 멈추지 않는 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나라들의 초과 긴축은 먼 미래의 장기적인 회복 여력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정금리 부채가 많은 미국이 성큼성큼 걷는 황새라면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한국은 짧은 다리 조류”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가 즉각 이자율에 반영된다. 올해 7월 말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200조 원을 넘어 전년 말 대비 7.76%나 증가했다. 정부가 빚을 줄이기는커녕 규제의 고삐를 느슨히 한 결과다. 예금은행 대출잔액이 2000조 원을 돌파한 2021년 평균이자율(잔액기준)은 3.04%였다. 단순계산하면 이자비용은 62조 3400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예금잔액은 2166조 원으로 5.6% 늘었지만 이자율이 4.92%로 치솟았다. 추정 이자비용은 106조 5600억 원이다. 1년새 71% 급증한 셈이다.
5.1%대인 현재 금리면 올해 이자액은 114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 은행대출의 60% 규모인 비은행 대출까지 감안하면 2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대출이자 부담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 7월까지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다. 9월 소비자물가도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는 감산에 따른 고유가가 반영되는 10월 이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은 이번에는 끝까지 멀쩡할 수 있을까. 미국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의 영향이 곧바로 이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들의 사정은 좀 다르다. 기업들은 3~5년짜리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수 부족에도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결국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갈수록 부담이다.
좀처럼 줄지 않는 미국 가계의 소비도 언젠가는 꺾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기 고정금리인 가계 부동산 대출과 주택관련 대출을 제외한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미 크게 높아졌다. 미국인들의 노후가 달린 증시도 최근 그 상승세가 꺾였다. 미국도 주택 공급부족인데 새로 집을 장만하는 이들은 높아진 고정금리 대출을 피하기 어렵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래될수록 미국도 점차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관건은 연준이 추가 긴축의 고삐를 풀지 조일지다. 미국이 추가 긴축에 나선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다시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과 달러 부족까지 겹치면 겨울철 전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무거운 가계부채 부담까지 고금리에 약점이 많다. 해외자본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