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나 그걸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마약 사건의 타깃은 마약조직이고 본질은 국민건강이다. 왜 연예인이 타깃이 되어 날아오는 돌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해야 할까. 희대의 엽기 살인범보다 더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뒤에서 뉴스를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연예인을 때려잡는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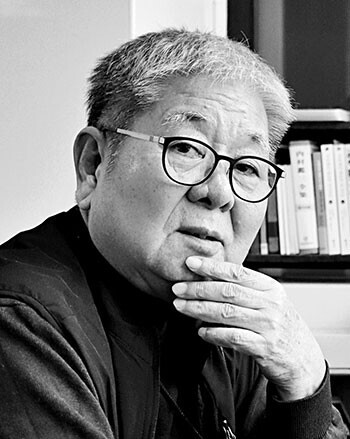
그는 뒤늦게야 그 드링크 속에 마약 성분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눈치 챘다.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그 무렵 수사기관에 마약 판매책이 검거됐다. 수사기관은 언론에 보도될 만한 인물을 불면 처벌을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흥정했다. 잔챙이보다 사회적 이슈가 될 인물을 잡아야 수사실적이 돋보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변호를 맡았던 그 가수가 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온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뒤늦게 알았지만 안 건 안 거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처벌을 받았다. 그 사건을 맡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수 중에는 예술을 위해 마약의 환각효과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는 법과 예술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란 생각이 들었다.
불을 지르고 무덤을 파헤치면서 광염소나타를 작곡한 예술가를 그린 문학작품을 읽은 적이 있다. 처벌을 각오하고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도덕적 법적 잣대를 굳이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순진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60~1970년대 최고의 가수 김추자 씨는 목이 아플 때 피워보면 좋다는 말을 듣고 대마초 한 대를 받아 빨아보다가 기침이 나서 그냥 재떨이에 버렸다고 했다. 그 꽁초가 증거가 되어 가수생활이 붕괴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동기와 과정이 다 다르다. 이 병원 저 병원 돌아가면서 프로포폴을 맞으러 다니다가 걸려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프로포폴을 놓아주고 돈을 받은 의사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몰랐을까. 돈 받는 재미에 모른 체한 것은 아닐까. 제약회사는 매상이 잘 오르는 마약류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할 놈들이 법망을 비웃으면서 환각파티를 즐기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오래 전 한 여배우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녀는 신문에 난 한 국회의원의 정치선전을 보고 분노하면서 내게 말했다. 그 정치인이 재벌2세들 몇 명과 마약파티를 하는 자리에 그 여배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배우는 그런 사실들을 확 불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마약파티를 해도 법에 걸리는 걸 보지 못했다. 아마 돈으로 수사기관을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는지도 모른다.
검사가 룸살롱에서 잔에 필로폰을 묻혀 마신다는 정보를 접한 적도 있다. 재벌이나 국회의원, 검사의 마약파티를 잡을 존재는 없다. 법망에 잡히는 것은 피라미들이거나 어정쩡한 연예인뿐이다. 성공한 한 연예인의 붕괴 과정을 대중에게 보이는 잔인한 서커스는 더 이상 흥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살인범의 얼굴은 가려주면서도 공인이라는 포장을 뒤집어씌우고 잔인하게 두들겨 패는 것은 이 사회의 이중적인 인격이다. 그 이면에는 드라마 한 편을 찍는 데 몇억 원, 광고 한 편에 수십억 원을 버는 데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잠재해 있는 건 아닐까.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