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교사나 공무원들이 많았다. 직원들도 착하고 성실했다. 그런데 나는 실버타운을 나오기로 결심했다. 바닷가에 집을 얻어서 살기로 결심했다. 왜일까. 그걸 말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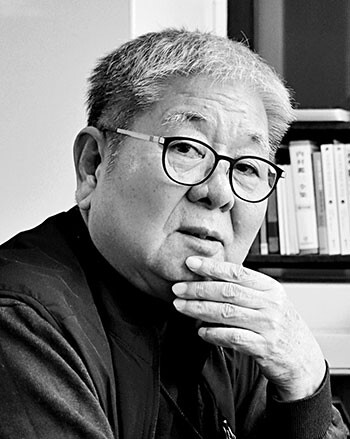
대부분이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다.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했다.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다.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내가 체험한 한국의 실버타운은 어땠을까.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이 맞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였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병에 걸린 노인이 손을 떨면서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그들을 보면서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어두운 장면이 떠올랐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좀비들의 세상이었다. 노인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시골 집밥이었다.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평생 맵고 짠 싸구려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나는 그 음식들을 뇌로 먹어야 했다.
노인들의 대화를 관찰해 보았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노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았다. 자식 자랑,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이 역시 있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했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을 ‘저승 가는 대합실’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했다.
노인들은 죽음을 가볍게 얘기하고 있었다. 목을 매달 밧줄을 준비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편 덩어리를 구하겠다는 노인도 있었다. 음식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밤사이 조용히 죽어 실려 나가는 노인도 있었다. 자식들은 자본주의가 광고하는 실버타운의 광경을 보면서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곳이 망각과 완만한 죽음이 지배하는 외진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 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스산한 느낌이 든다. 엊그제 실버타운에서 친했던 70대 후반의 노인이 나를 찾아왔다. 평생 보잉기를 몰던 여객기 기장이었다. 수십 년을 밤하늘에 떠있는 상자 같은 조종실에서 지내면서 외로웠다고 했다. 그는 실버타운에서도 혼자 있었다.
그런 그가 아들 집으로 가게 됐다며 좋아했다. 구석방에 있어도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을 맡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였다. 그 노인에게는 실버타운의 좋은 시설이나 골프보다 가족과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행복인 것 같았다.
또 다른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을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분이었다. 그 할머니는 내게 속 깊이 숨긴 섭섭함을 넌지시 내비쳤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잡아주지 않은 것이 못내 서운한 것 같았다.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광경 뒤에는 외로움과 단절에 눈물짓는 노인들이 가득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엄상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