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월께 50대쯤의 남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왔다. 넘어져 뒤통수를 다쳤다. 뇌경막에 피가 고이고 생명이 위험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8시간에 걸친 수술로 환자를 살렸다. 하루가 지나 보호자가 나타났다. 별거 상태의 부인이었다. 부인은 당장 환자를 퇴원시켜달라고 했다. 본인 부담이 하루에 몇 백만 원인 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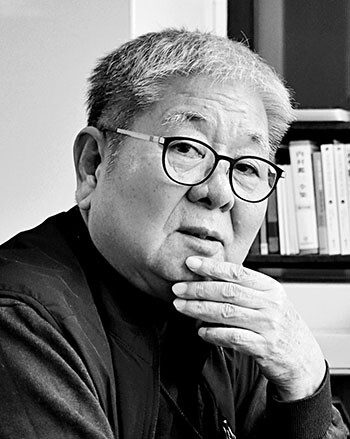
의사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은 ‘의사의 법적인 설명의무’였다. 의료소송에서 많은 의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의사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어느 날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판사를 만나 설명의무의 한계를 물었다.
“멀쩡하게 병원으로 걸어 들어간 환자가 죽어서 나왔어요. 판사는 의학지식이 없죠. 전문가인 의사에게 왜 죽었나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대부분의 감정서가 의사들을 두둔하죠.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게 하는 방법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유밖에 없어요.”
의사들은 판결문에 써 있는 글씨만 볼 줄 알지 그 이면은 알 수 없었다. 유명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 내게 이런 말을 했었다.
“수술을 하다보면 아주 미세한 뼛조각이 피에 범벅이 되어 찾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뼛조각이 신경을 건드려 환자의 하반신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경우 의사가 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수술을 하고 싶겠습니까?”
환자의 시각과 의사의 입장이 달랐다. 편법 운영도 있는 것 같았다. 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가 내게 이런 비밀을 털어놓았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척추 수술을 세 번으로 나누어 하라고 해요. 보험수가를 높여서 받으려는 편법이죠. 제 환자가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왜 아프냐고 물어볼 때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수술을 일부만 했는데 아픈 게 당연하죠.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환자에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시 의사들은 그 세미나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문제점들을 건의했었다. 운동권 출신의 장관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의사들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의사들은 법적 위험이 적고 돈을 많이 버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요즈음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병원 응급실이 마비됐다. 의사들 저항의 명분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지만 본질은 의료계 내부의 잠재됐던 불만이 터진 건 아닐까. 의사들의 태도를 보면 투쟁이라기보다는 ‘나 안 해, 안 한다고’하면서 막가는 것 같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응급실을 돌아보고 진찰료와 조제료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보도를 봤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의사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의사들에게 기회가 아닐까. 의사들은 정권과 싸우는 투쟁가가 아니다. 이런 때 법 규정 한 줄이라도 만드는 게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지혜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 기회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다는 그들만의 프라이드와 보람을 살릴 수 있는 찬스다. 의사들에게 교통사고 처리법을 힌트로 던지고 싶다. 보험에 들어있으면 운전 중 사람을 다쳐도 면책이 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떡을 주려고 할 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