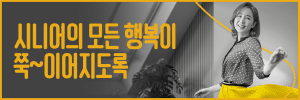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
||
| ▲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와 분양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건설업계에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
‘대주 피오레’라는 브랜드로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주택사업을 펼쳐온 대주건설이 최근 위기를 넘겼다. 돌아온 어음을 막지 않을 경우 1차 부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대주건설은 그동안 업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고가분양 전략을 펴오면서도 외형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만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 수많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모 지역 아파트의 시행사인 S 사는 9월 초 금융회사들로부터 차입한 350억 원의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 문제는 약정상 시행사인 S 사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주건설이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채무를 인수했어야 한다는 점. 하지만 대주건설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대신 시행사가 갚지 못한 350억 원의 상환계획과 자금경색 우려에 대한 자구책 등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룹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자금위기설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채무 인수에 대한 불이행으로 대주건설의 기업신용등급은 일시에 3단계가 추락, 투기등급(BB-)으로 떨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발단이 된 채권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대한화재 등 자회사와 보유 골프장의 매각 등 구체적인 자구책 내용을 보강해 사업의 계속성을 이해시키면 하향된 채권 등급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대주건설이 잘못될 경우 채권시장과 금융권이 입게 될 손실이 커지고 다른 건설사에 대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가 크다. 대주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만 해도 10여 개, 도급 시공하는 사업장도 30여 곳이 돼 앞서 다른 업체들의 부도보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경우 최근 업계에 줄도산 공포를 만들어낸 신일이나 세종건설 등을 능가하는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다만 매각 가능한 자산이 많고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난해까지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견지해 왔다는 점은 신용회복을 통한 위기 탈출 가능성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건설은 중견업체들 중에서도 재력이 탄탄한 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련해 알력이 있는 것이지 부도로 이어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이런 공포심리로 인해 시장에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얼마 전 시장의 루머에 곤욕을 치렀다. 태영은 시공사로 참여하는 평창 고급리조트 알펜시아의 사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9월 들어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루머의 내용은 고급 리조트인 알펜시아 사업이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위기설에 빠졌다는 것. 그러나 이는 사업의 성격이나 시공을 고려할 때 틀린 내용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알펜시아 사업은 크게 3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동부건설, GS건설, 태영건설이 나눠 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은 도급공사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액 자금을 대고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리조트는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강원도의 레저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라며 “태영건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업권이 없는 단순 시공사로, 사업주체인 강원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부도를 맞아 주인이 바뀐 지방 A 건설사도 최근 다소 사그라졌지만 도산 가능성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결과도 없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 건설과 그룹사로 커버린 지방 C 건설도 연내 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만 보면 주택건설업계의 부도 공포는 단순히 경고성만은 분명 아니다. 나름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론 분양시장 침체가 주요인이다.
가까스로 청약자수가 공급가구수를 넘었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입주를 목전에 뒀거나 이미 입주를 시작한 단지에서도 ‘웃돈’이 없으면 집단해약이 들어오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해당 업체들이 입단속을 하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다. 주택업체들 사이에선 이미 ‘뻥튀기’ 분양률 발표가 노골화돼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성화에 못 이겨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준 게 고작이다. 사전 예방이나 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명동 사채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안주해 현재의 사태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주택업계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중소 건설업체들의 위기설은 자연스럽게 금융회사들의 손실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위험 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는 터무니없이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PF에 대출을 해줄 때도 대부분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담보로 잡은 토지 등을 다른 건설사에 넘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PF가 문제되는 것은 담보로 잡은 물건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 정도”라며 “현재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보유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복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