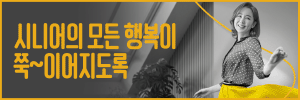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
||
| ▲ SBS 드라마 <불량커플>의 한장면. | ||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최근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다. 미혼남녀 624명(남성 295명, 여성 329명)에게 ‘휴가철 솔로가 좋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남성의 38%, 여성의 31%가 ‘휴가지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답변이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K 씨(여·25)는 꿈꾸던 휴가철 로맨스가 현실이 됐다. 지금이야 천생 여자지만 대학시절 록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화려한 과거의 소유자다. 그는 매년 여름휴가 때마다 대규모 록페스티벌 축제에 간다. 7월 말이면 3일간의 일정으로 어김없이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서 지금의 특별한 남자친구를 만났다.
“1년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행사라서 국내 록음악 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축제예요. 그곳에는 평소 꾹 눌러 담았던 ‘자유’가 넘실대죠. 복장도 행동도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마치 월드컵 때처럼 모르는 사람들과 금방 친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지난해에도 무대에 오른 밴드를 향해 괴성을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외국인이랑 어깨동무를 하고 뛰게 됐어요.”
그 외국인은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 K 씨보다 세 살이 더 많은 그는 쌍꺼풀 없는 동양적인 눈매에 글래머러스한 K 씨에게 곧 반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친구들과 3일 내내 빗속,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음악을 들었다. K 씨는 “그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후에 취향이 잘 맞아 사귀게 됐다”고 말했다.
로맨스가 악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컨설팅업계에서 일하는 O 씨(여·32)는 지난해 8월에 단짝 친구와 태국으로 휴가를 갔다. 3박 4일 일정이었고 목적은 휴양이었다. 하지만 ‘솔로부대원’이 많은 휴가지에서의 하룻밤은 해외여행의 매력이다.
“아는 사람도 없겠다, 한국에서는 시도하지 못할 과감한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서 친구와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 둘이 온 일행을 만났죠. 한 살 연하였어요. 게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마음 편하게 즐겼죠. 당시 저는 사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호감은 서로 있었지만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사단은 한국에 돌아와 일어났다. 휴가를 다녀온 지 며칠 후 절친한 여자 후배가 연락을 해왔다.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지원사격을 좀 해달라는 요구였다. 약속장소에 간 순간 O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휴가지의 ‘그’였다. O 씨는 “그 남자도 후배에게 내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나름 보수적인 이미지였던 터라 난감했다”며 “그 뒤로 둘이 사귀는 것 같았지만 일부러 내색을 하진 않았고 그 커플이 헤어질 때까지 늘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휴가지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재미있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원 강사인 L 씨(여·26)는 휴가 때에 맞춰 대학시절 몸담았던 동아리 MT에 함께했다. 오랜만에 모인 선후배인 데다 여대 출신인지라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리조트를 누비는 재미가 쏠쏠했다.
“강원도 산골자락에 있는 리조트 근처에는 딱히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리조트 안에 어지간한 오락시설은 다 있어서 처음에는 재미있게 놀았는데 곧 지겨워졌어요. 그럴 때는 꼭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모였겠다,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리조트 내 야외 수영장에 ‘잠입’했죠. 9시 이후 야간에는 출입금지였던 곳인데 12시가 넘어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놀고 나서야 왜 금지시켰는지 알았어요.”
어둠을 틈타 야간에 즐기는 물놀이는 큰 재미를 안겨줬다. 속옷까지 다 벗고 다섯 명이 숨죽이며 스릴 있게 놀다 들어온 시간이 새벽 3시. 지칠 대로 지쳐서 방에 돌아온 일행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다. 모기한테 제대로 당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다섯 명이 합쳐 200방이 넘었단다. 산골 모기의 위력은 대단해서 휴가가 끝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L 씨는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에 모기 물린 자국을 훈장처럼 달고 다녀야 했다.
아찔한 휴가 경험도 추억을 장식한다. 음반회사에 근무하는 B 씨(30)는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총 6일간의 일정으로 3일간은 따로 다니고 3일을 함께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온천으로 향하시고 저는 배낭여행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비둘기호에 해당하는 열차를 무작정 탔어요. ‘가다보면 도시가 나오겠지’ 했는데 웬걸, 가면 갈수록 인적은 없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심지어 역무원도 없는 역만 계속 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내렸는데 변변한 가로등도 없어 깜깜하지,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지… 무척 초조했었어요.” B 씨는 밀려오는 공포감에 무조건 철길을 따라 걷고 뛰기를 반복했다. 그러길 2시간이 지나서 겨우 민가를 발견했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손짓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해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다. 그는 “그 뒤로 낭만이고 뭐고 계획되지 않은 낯선 곳은 잘 안 간다”며 진저리를 쳤다.
얼마 전 한 백화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서지에서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직장상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휴가지에서 마냥 일탈을 즐기다 보면 탈이 날 수 있다. 거짓말처럼 상사가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일. ‘적당한 자유’가 무사 휴가의 길인 듯하다.
이다영 프리랜서 dyle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