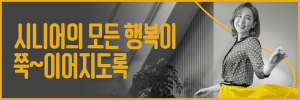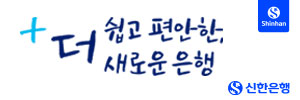스타벅스 등 국내외 대형 커피전문점은 커피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전 매장 수 늘리기 작전에 들어갔다. 일요신문 DB
커피전문점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신규 점포를 낼 때 5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회에서는 이는 동일 브랜드에 대한 거리제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권 안에 다른 브랜드의 출점이 가능하다며 거리제한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출점 자체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나선 것이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기업 커피전문점이 눈을 돌린 곳은 이미 자리를 잡은 중소 브랜드 커피전문점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전 매장 수 늘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업체에 따르면 대기업 커피전문점이 중소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찾아가 대형 브랜드로 간판을 바꾸면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 브랜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 A급 자리에 위치한 300㎡(90여 평) 알짜 가맹점을 2년 전 대기업 브랜드에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해당 대기업은 가맹점주를 찾아와 4년째 중소 브랜드로 운영 중인 점포를 자신의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달면 점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은밀히 제안해 왔다. 가맹점주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었다. 해당 중소 브랜드는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도 없던 상황. 가맹점주는 대기업으로의 브랜드 교체를 결정했다.
해당 중소 브랜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맹점 하나를 개설하는 데는 적지 않은 인적, 물적 노력과 비용이 든다. 해당 점포의 경우 광고비, 판촉비, 인건비 등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된 곳인데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며 “그렇다고 좀 더 좋은 조건 찾아가겠다는 가맹점주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씁쓸해 했다.
대형 브랜드에 가맹점을 빼앗긴 또 다른 중소 브랜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카페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입점, 상가 임대료를 두세 배 올려놓고 있다”며 “결국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커피 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대형 브랜드 매장의 증가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보다 임대인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들어 커피전문점 보증금과 월세는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권리금은 전반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커피전문점 보증금과 월세는 3.3㎡(약 1평)당 251만 원, 13만 8000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커피전문점 보증금은 2009년 하반기 3.3㎡당 166만 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지난해 하반기 들어 처음 250만 원선을 넘어섰다. 월세 역시 2009년 하반기 8만 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꾸준히 오른 끝에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13만 원 후반을 기록했다. 반면 임차인들의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504만 원으로 2011년 역대 최고치인 3.3㎡당 579만 원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커피전문점에 대해 “자영업자보다 건물주가 선호하는 업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커피전문점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인 외국계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협상을 통해 점포를 늘리고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치장된 커피전문점이 싫을 리가 없고, 건물 내 다른 점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보증금과 월세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면에서도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이윤 창출이 예전과 같지 않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커피전문점은 입지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고 최근에는 매장의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 1억 원 미만 소액으로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라며 “큰돈 들여 창업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