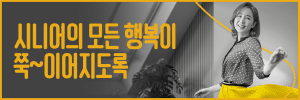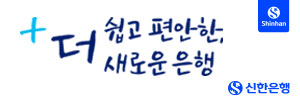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왼쪽)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5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향후 합병 시너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단순한 산술적 합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적정한 적용 PER 구간은 올해 주당이익(EPS) 대비 30~35배 정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간 7000억~8000억 원의 세전이익을 내는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5조~26조 원. PER 기준 30~35배 정도다.
올해 합병법인의 경영실적은 어떨까? 다음과의 합병에 앞서 카카오는 외부평가기관인 삼정회계법인과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평가결과에는 카카오와 삼정회계법인이 예측한 향후 5년간의 예상 매출과 이익이 포함됐다. 예상 수치를 보면 매출과 세전이익이 2014년 4296억 원과 2216억 원, 2015년 7378억 원과 3875억 원, 2016년 9598억 원과 5176억 원, 2017년 1조 1753억 원과 6334억 원, 2018년 1조 3553억 원과 7210억 원이다.
따라서 올해 다음이 지난해(840억 원)만큼의 세전이익만 내도 합병법인의 세전이익은 최소 3000억 원이 된다. PER 30~35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9조~10조 5000억 원이 된다. 현재보다 2배 이상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카카오의 향후 5년간 이익전망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이다. 성장동력이 다했다는 다음도 지난 5년간 매출은 2배, 세전이익은 1.3배 성장했다. 이렇게 추정하면 합병법인은 2018년에 매출 2조 4500억 원에 세전이익 8000억 원이 된다. 올해 네이버의 매출 및 세전이익과 비슷하다. 이 같은 추정이 맞는다면 합병법인 주가는 향후 5년간 현재보다 8배가량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외부평가기관과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을 내야하고, 기존 다음의 포털 사업도 합병 시너지로 지난 5년보다 못하지 않게 성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은 세계 230여 국, 4억 2000만 명(5월 말 기준)이 사용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글로벌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약 8000만 명이다. 네이버의 ‘밴드(BAND)’도 사용자수가 약 3000만 명이다. ‘카카오스토리’의 1분기 월평균적극사용자(MAU)는 2400만 명이다. 5월 25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 내에서 총 51개국 중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다운로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와츠앱’은 46개국, 라인은 27개국, ‘위챗’은 15개국이다.
올 1분기 네이버의 해외매출 비중은 28.4%다. 지난해 1분기의 18.2%보다 무려 10.2%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다음과 카카오는 해외매출이 거의 없다. 지난해 네이버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데는 라인이 일본을 통해 해외진출에 성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카카오는 페이스북과 와츠앱, 라인, 위챗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시장에서 부족한 마케팅 비용으로 고전해왔다.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해외 마케팅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상장을 추진했었고, 이번 합병 역시 해외 마케팅 비용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합병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확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합병 직후 다음의 적정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는 다음이 확보한 광고주 풀(Pool)과 콘텐츠·검색엔진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 진출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도 “카카오가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었다”며 “합병의 성패도 앞으로 해외에서의 선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최열희 언론인